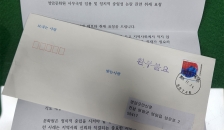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
농번기 철엔 논밭으로 찾아가 배달
시골마을 풋풋한 인심 살아있어요
기자가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이었다. 푸른 눈의 이국 소녀 펜팔친구에게 “I am a boy…”라고 며칠 밤을 새우며 쓴 편지를 보낸 후, 수 개월간 매일 학교가 파하면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 우편집배원 아저씨를 기다렸다. 편지를 기다렸다.
체신부 마크가 그려진 빨간 자전거에 고동색 큰 가방을 실은 우편집배원 아저씨가 시야에 들어오면 반가움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먼저 달려가 외국서 온 편지 없냐고 안달하며 묻곤했다.
우편집배원은 그토록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전화 보급률이 낮고 인터넷, 핸드폰이 없던 시절 유일한 통신수단이라면 편지 뿐이었으니, 도시로 유학간 아들의 편지나 성적표를 논두렁 밭두렁에서 받아보시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우편집배원은 아들처럼 반가왔으리라.
모두에게 풍성한 명절, 추석을 앞둔 요즘 가장 바쁜 이들이 우편집배원이다.
영암우체국 우편물류과 우편집배원 정인천(31)씨. 그는 올해 집배원을 시작한지 6년째이다.
“기쁜 소식을 배달해 준다는 데서 일의 보람을 찾습니다”
정씨는 정다운 우리 이웃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배달한다는 것에 소명감과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다. 추석을 앞둔 요즘 년중 가장 바쁘고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선물 택배를 포함한 우편물이 평소의 3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가 요즘 배달하는 우편물량은 2천 200여 통이다. 평상시에도 700여 통을 배달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e-메일 이용이 늘어 ‘부모님 전상서’라 쓴 문안 편지도, 연인사이의 애정편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각종 공과금 통지서나 고지서, 청구서, 그리고 택배물품이 우편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정씨는 시골마을의 풋풋한 인심과 정은 아직 살아 있다고 말한다.
“농번기철 시골마을에 배달을 가면 어르신들이 “고생한다”며 음식을 먹고 가라고 합니다. 소박한 시골 인심을 느낄수 있지요”
또 농번기철엔 시골 농가의 우편물 배달은 논두렁 밭두렁으로 배달을 간다고 한다.
“주민이 집에 없으면 논으로 밭으로 찾아갑니다. 어느집 논밭인지 모두 알거든요”
정씨는 우편물을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챙기고 배달한다. 배달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씨의 일에 대한 소명 의식이다.
“우편물은 보내는 분이나 받는 분 모두에게 소중한 것 이잖아요”라고 말하는 정씨는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25.12.02 16:32
2025.12.02 16:32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