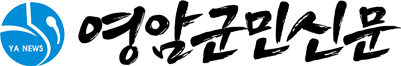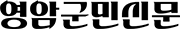양파속살을 벗기듯 숫자를 세어도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침대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저녁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더 검게 구어져야 한다
밤의 소리들이 안방에 숨어 있다
대낮에 못다한 서류뭉치를 핥듯 잠은 허공을 들었다 놓는다
스무 살때 재미있는 책을 볼라치면 아버지의 눈은
술래였다
들키는 날에는 나는 꿈속에서 술래가 되어야 했다
그때 밤은 빠른속도로 시골담을 넘나 들었다
하루종일 들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던 시절
한밤중에 잠과 술래잡이를 하던 나
적막한 방에 먼 집 수탉소리가 들렸다
술래잡기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어둠의 이불을 끌어안고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다.
임영자
전 솔문학 사무국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1 02:50
2026.01.01 02:50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