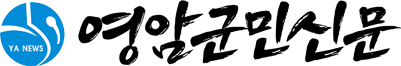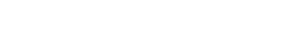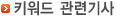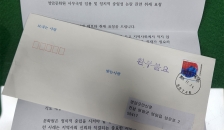특히 가축방역체계부터 제대로 가다듬어야 한다. 국내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청주·증평서 발생한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 반면 전남서는 그 전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의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영암군에서 발병으로 무색해졌다.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허술한 방역체계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 같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항체형성률(전체 사육마릿수 중 구제역 항체를 가진 개체의 비율)은 96.5%로 전국 평균(97.3%)보다 0.8%포인트 낮았다. 영암은 이런 전남 안에서도 낮은 92.3%에 그쳤다. 방역은 최소가 최대를 결정짓는 이른바 ‘최소율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다. 항체형성률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구제역이 집중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다. 영암지역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한우 중 암컷 비율이 압도적인 점도 의도적인 백신 접종 기피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백신접종 과정에서 임신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산 또는 사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암소 접종을 의도적으로 건너뛰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제역 사태 종식은 궁극적으론 한우농가들 손에 매였음이다.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가다듬는 일은 구제역뿐 아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이미 전남 곳곳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발생했다. 이들 질병의 차단은 철저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와 농가의 적극적인 차단방역만이 그 해답이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선 접종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까지도 염두에 둬 잘 가다듬어야 한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영암 한우산업의 위상 회복이 여기에 달렸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12.01 07:27
2025.12.01 07:27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