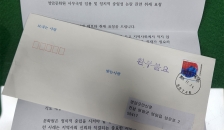2003년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다 실신 직전까지 갔다.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가십성 기사거리였지만 김 전 대통령의 원통함과 분노는 극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주치의가 달려오고 가까스로 진정한 김 전 대통령은 휠체어에 실려 아무도 모르게 청와대를 빠져 나갔다. 이 때 노 전 대통령은 현관 앞까지 달려 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한동안 어찌할 줄 몰랐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애정 또한 남달랐다.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전생에 친형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애통해 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이 열리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영결식 후 권양숙 여사의 손을 잡고 소리 내어 통곡하던 모습이 아직 생생하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추모 청주시민위원회’가 성금 400여만원으로 제작한 표지석이 안착하지 못한 채 5년째 갈 곳 없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초석을 깔아놓고 저승에 간 두 전직 대통령의 마음이 오죽할까 답답하기만 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01 09:57
2025.12.01 09:57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