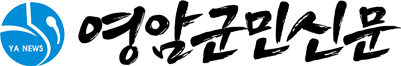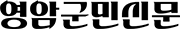이 도시도 과거엔 우리 농촌처럼 인구와 소득감소, 고령화가 심각했다고 한다. 소득원은 해발 500-700m 산간의 계단식 포도밭과 올리브 밭이 전부였다. 인구 1만4천명의 보잘 것 없는 이 도시를 탈바꿈시킨 계기가 바로 '슬로운동(slow movement)'이다.
슬로운동에서 '슬로(slow)'는 '속도'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즐거운 기다림'이다. 물질과 기계의 속도에 맞추는 대도시가 '패스트시티(fast city)'라면 인간과 자연환경의 속도를 존중하는 삶이 유지되는 곳이 바로 슬로시티다. 말하자면 '즐거운 기다림의 도시'라고 할까?
그렇다고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게 아니다. 인간과 환경을 위협하는 '효율성'과 '속도' 지상주의서 탈피해 자연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목표다. 대량생산과 규격화, 산업화와 기계화를 통한 '패스트푸드', 맛의 표준화를 지양하고 국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슬로푸드(slow food)운동'이라 한다. 바로 슬로시티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레베 인 키안티를 세계 첫 슬로시티로 만든 파올로 사투르니니(Paolo Saturnini) 시장이 1999년 '슬로시티 선언문'을 선포하는 데는 고집스럽고 의미 있는 노력이 뒷받침됐다. 첫째로는 절대로 지역민이 중심이 되고, 둘째로는 지역민 또는 마을이 주인공이며, 셋째로는 철저하게 지역민 소득을 염두에 둔 점이다.
실제로 파올로 시장은 취재하러 온 언론인들이나 견학하러 온 관광객들에게 자신이 아닌 정육점 주인, 포도농장 주인 등을 앞세워 '스타'로 만들었다고 한다. 또 일정구역에만 주차장을 만들어 방문객들이 모두 걸어서 마을을 돌아보게 했다. 도시 전체를 자연친화적 산책로로 만들었다. 다름 아닌 마을 체재시간을 늘려 지역 내 소비를 높인 것이다. 최초의 슬로시티는 고집스런 파올로 시장의 집념과 리더십, 그리고 이에 적극 호응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우리 고장 영암에도 '지역사회 지도층과 주민들이 가꾸기에 따라서는' 이탈리아의 그레베 인 키안티를 능가할 곳이 있다. 바로 호남 3대 명촌으로 꼽히는 '구림마을'이다. 풍수지리상 명당 중의 명당이요, 풍수지리의 대가 도선(道詵)과 '별 박사' 최지몽(崔知夢)이 태어난 곳,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이곳을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지도층과 주민들이 가꾸기에 따라서는'이란 전제를 붙인 이유는 파올로 시장의 집념과 리더십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구림마을에는 부재(不在)한 것 같아서다. 이대로 뒀다간 호남 명촌은 이름뿐일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앞선다. 지금이라도 구림마을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길 제안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1 11:59
2026.01.01 11:59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