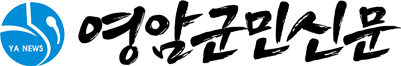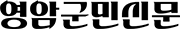|
'산길을 오르며'라는 졸시를 오래 전, 어느 신문에 발표했다. 시를 읽은 아내가 물었다. "당신, 나 보라고 이 시 지었지요?"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알았으면 됐네 이 사람아, 그렇지만 뭐 꼭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겠어..."
며칠 후 어떤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는데 시를 읽고 나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글 한 편이 이렇게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가 싶어 놀랐다.
그랬다. 힘든 시절이었다. 두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아내는 새벽에 직장에 나가 오후 늦게 들어왔다.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것은 내 몫이었다. 경기가 좋지 않았다. 세금보고 수입 난에 땡전 땡푼을 기록했던 것이 그 무렵이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들이 군것질을 하고 싶어 할 때면 모른 척 해야만 했다.
경제가 어려우면 별거 아닌 일로 부부사이에 티걱태걱 하는 일이 많아진다. 쌀쌀한 집안 분위기는 아이들이 먼저 눈치를 챈다.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 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어느 날 쪽지를 내밀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와 헤어지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를 바라보았다. 눈물 글썽한 눈에 근심이 가득했다.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아들을 꼬옥 껴안아 주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런 편지를 썼을까. 아빠가 잘못했다. 나는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을 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헤어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 시 한 편을 썼다.
쪽지를 건넸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 젊음은 설익음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른다. 대추 한 톨을 익히기 위해 햇볕이 내리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친다. 부부도 세월과 함께 익어간다.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야한다. 하마터면 아내와 헤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이 떠올랐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이 아니던가.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고 보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나도 이제 철이 좀 들었을까. 어느 날, ‘아내’라는 시 한편을 썼다. "대숲이 / 바람에 쓸린다 // 속 빈 대나무를 저리 / 높이 키워 올린 것은 / 큰 바람에 낭창 휘어지다가 / 버팅기며 끝내 일어서는 것은 / 짱짱하게 받쳐 준 / 마디 / 때문이다"
시 두 편 사이를 걸어온 세월이 아슴하다. 내가 만들어 걸어온 길이다. 돌아보면 아슬하고 아득한, 그리고 아늑한 추억이다. 내 앞에 남아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 궁금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31 21:25
2025.12.31 21:25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