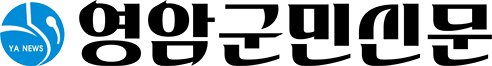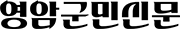|
벽에 일과표가 붙어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정이 빽빽하다. 교실을 돌아보는데
복도에 ‘오늘은 정말 오실까’라는 제목의 그림이 노래가사와 함께 붙어있다. 그리운 아버지 장군님을 기다린다는 가사다. 아이들이 율동을 하다가 손을 흔들어준다. 입을 쭈욱 내밀며 장난을 걸어오는 아이도 있다.

원래 사리원은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면소재지였는데 지금은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인구는 30만 정도라고 한다. 봉산탈춤의 본향인 봉산탈춤 경연대회가 추석 무렵에 매년 이곳 경암루에서 열린다고 한다. 농장별, 탈춤경연을 통하여 대를 이어 후계자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차를 타고 산을 빙 돌아 꼭대기에 있는 ‘선군정’에 올랐다.

선군정에 올라온 아이들을 만났다. 중학생 정도로 보였는데 몇은 고등중학교 졸업반이라고 한다. 남쪽으로 말하면 고3이란 얘기다. 좀 놀랐다. 졸업한 다음 계획을 물어보았더니 군에 입대할 계획이란다. 아이들이 똑똑하고 당차다. 저렇게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사회의 희망이다.
개성 도착,

개성 시내로 들어선다. 개성은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옛 수도다. 고려왕조와 함께 500년 가까이 한민족의 수도로 군림했다. 수도일 뿐만 아니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기와집 처마를 따라가면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개성.
화려했던 시절을 꿈꾸고 있는 듯, 옛 도성이 어둠에 잠기고 있다.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지나간다. 가로등 없는 골목길이 오히려 정겹다. 잠자리는 한옥으로 정했다.
저녁식사가 나오는데 13첩 밥상이다. 열세가지 반찬이 올라왔다. 반찬 그릇이 고만고만한 작은 놋그릇이다. 이런 밥상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다. 식사를 하는데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 “전기가 긴장합네다” 내가 농을 건넸더니 운전사 방 동무가 소리 내어 웃는다.
잠자리는 온돌방에 이불을 깔아놓았다. 불을 껐더니 창호지 문에 댓잎 그림자가 흔들린다. 저런 풍광을 본 지가 30년도 넘은 성싶다. 잠을 못이루고 뒤척이는데 마당 건너 별채에서 코 고는 소리 들린다.
개성의 아침 풍경

날이 밝아온다. 가만히 누워있으려니 바람에 댓잎 쓸리는 소리가 들린다. 반닫이며 경대 같은 방안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가만히 쓸어보니 왕골 돗자리의 그 섬세한 오돌토돌하고 가지런한 느낌이 전해온다. 30년 전쯤의 우리 집 안방에 누워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까. 김 참사가 헛기침을 한다. 그만 일어나시라는 신호다. 여섯 시다. 개성시내 아침 산책을 나간다. 파킹랏쪽으로 걸어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데 대문이 잠겨있다. 자그마한 쪽문으로 나가려고 하니 제복을 입은 사람이 신분증을 보자고 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묵은 여관 단지가 담으로 싸여있어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인가 보다.
개성공단 통근버스가 지나간다. 푸른색 36호 버스다. ‘개성공업지구관리사무소’라는 글씨가 보인다. 길가 기와집 처마 밑 인도를 따라 아주머니가 머리에 함지박을 이고 걸어간다. 한 손은 바가지를 잡고 한 손은 뒷짐을 졌다. 간당간당한 뒤태가 영락없이 옛날 우리 고모를 닮았다.
길가 기와집들은 아랫부분을 벽돌로 쌓았고 길 쪽으로 창문을 내놓았다. 우리의 전통 기와집 형태다. 인도를 따라 전봇대 사이에 띄엄띄엄 은행나무 가로수가 서있다. 나무 아랫부분에 하얗게 페인트를 발라놓았다. 무 배추를 가득 실은 수레를 남자가 끌고 여자가 밀고 간다. 부부인 성싶다.
개성 남대문 앞. 고려 때 건축물이다. 서울에 있는 남대문이 이곳 개성에도 있다. 큰 도시에는 저렇게 대문을 만들어 백성들의 통행을 관리해왔다는 얘기다.
교통순경이 서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한길을 건너간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보인다. 남자나 여자나 자전거에 시장바구니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핸드백을 멘 아주머니기 아이를 업고 바쁘게 걸어간다. 아이를 어느 곳에 맡겨 놓고 출근을 해야 하는 모양이다. 자동차는 이따금 지나간다.
아이들이 무어라 재잘거리며 하천변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걷고 있다.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의 발길도 못지않게 분주하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여자아이 뒤로 딸을 자전거에 태우고 달려가는 어머니도 보인다. 개성의 아침 풍경이다.
아침밥을 먹었다. 전통한옥 아랫목에 앉아 밥을 먹고 숭늉으로 목을 축인다. 밥과 국, 그리고 젓갈 한 가지와 조림 하나, 나물과 계란 후라이 한 개가 올라온 단출한 밥상이다.
선물가게에 들렀다. 점원이 반갑게 맞는다. 선옥희, 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선생님, 저 풍산개 좀 보시라요.” 그림을 가리킨다. 남에는 진돗개, 북에는 풍산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홍삼가루 하나에 50달러로 가격이 붙어있다. 두 개에 50달러 줄 수 없나요? 옆에 있는 어떤 손님이 물으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은다.
“저렇게 흥정을 하면 기분이 개운치 않단 말입네다. 이 감정을 어케 못합네다.” 그 손님이 나간 다음에 기분이 상했는지 한 마디 한다. 유럽의 어떤 자본가가 이곳 개성에 투자하여 전기를 비롯한 기반 시설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있다.
“여기는 숲이 무성해도 모기가 없단 말입네다. 있어도 목재 때문인지 아니면 별난 새가 있어 그러는지 맥을 못춥네다.” 살기 좋은 개성에 다시 오시라서 인사를 건넨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31 12:03
2025.12.31 12:03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