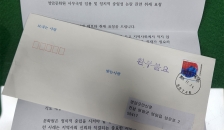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
어릴 적 내가 게으름을 피울 때면 혀를 끌끌 차며 어머님이 내게 했던 말씀이다. 실제로 그 말을 나한테 입증시키기로 작정이나 한 듯 어머니는 어린 내가 보기에도 놀랄 만큼 모든 일에 열심이셨다.
어둑한 새벽, 호드득 호드득 아궁이에 불 지피는 소리, 솥 닦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일과는 시작되었다. 땅거미가 들도록 농사일을 했고, 밤이면 헤진 옷을 꿰매셨다. 날 궂은 날은 우리를 위해 부침개를 부치거나 집안 청소를 하는 등, 손을 가만히 놓은 때가 없을 정도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뿐이 아니었다.
마을의 어머니들도 다들 그렇게 열심이었다.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었다. 우리의 누이들도 그렇게 살았다. 어머니를 따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집안일은 물론 농사일도 웬만한 남정네 못지않게 거들었다.
농토가 많지 않은 집의 누이들은 외지에 나가 돈을 벌어왔다.
김지하 시인이 1970년에 발표한 시 ‘서울 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도 시름겨운 목마른 고개 넘어 / 팍팍한 서울 길 몸 팔러’ 황토길 따라 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났다.
연속극에 나오는 공장직공이나 가정부가 대부분 전라도 사투리를 쓸 만큼, 많은 우리의 누이들이 품 팔러 서울로 올라갔다. 가서 몸으로 품을 팔아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근래, 이곳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온 5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 한국가정에 가정부로 취업들을 하고 있다.
미국 입국비자가 까다롭다 보니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신분으로 들어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씩 비자를 연장해 가며 일을 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그동안 히스패닉 가정부를 주로 고용해서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을 맡겨 왔는데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다.
음식 만드는 법을 몇 번이고 가르쳐 주었지만 입맛에 맞지 않았고, 아이들이 가정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등 교육적인 면에서도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비슷한 가격에 한국 아주머니를 입주시켜 함께 생활해보니 좋은 점이 너무 많더란다.
우선,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주어 음식 걱정이 없어졌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때로는 숙제까지도 돌보아 주어서 교육적으로도 아주 만족한다고 했다.
집안일도 내 집처럼 잘 돌보아 주지만 집에 어른이 있어서 마치 친정어머니가 와 계신 듯 편안하다고도 했다.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부터 맞벌이 부부들이 한국 아주머니를 선호하게 되었다.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 주부인 이들 아주머니들이 입주를 해서 처음 받는 임금은 월 2천500달러 정도다.
계약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 입주해서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 되니 받은 돈은 고스란히 저축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한 아주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젊은애들도 일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할머니가 다 된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에요. 놀면 뭐해요, 이렇게 나와 미국 구경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죽으면 썩을 삭신인디…”
우리의 누이들이 돈벌이를 위해 황톳길 따라 집을 떠나던 모습이 떠오른다. 시대가 달라져 이제 미국에 가정부로 취업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이륙하는 아주머니를 생각하게 된다. 사용자 측이나 고용자 측에서 모두 만족하는, 이를테면 윈윈이 되는 일이라니 다행이다.
우리들의 어머니로부터 누이에게로 면면히 전해오는, 가난한 가정과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저 빛나는 근면정신. 어머니가 내게 해 주시던 말씀을 오늘 LA에 일하러 온 한 아주머니를 통해 다시 듣게 된다. “죽으면 썩을 삭신…”
정 찬 열 www.yanews.net
 2025.12.02 16:32
2025.12.02 16:32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