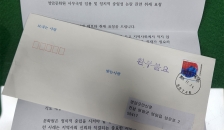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
이러한 그룹들은 조직내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활동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 틈만 나면 끼리끼리 모이며 형제애를 강조하며 조직 결속을 다진다. 그리고 그룹의 우두머리에 충성을 맹세한다. 우두머리가 지시하는 일은 좋던 싫던 또 옳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말없이 실행에 옮긴다.
조직과 파벌은 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 대립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쉽게 이해가 간다.
조직(組織)은 어떤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합된 개개의 역할을 지닌 요소들의 집합체다. 전문적으로 분화된 기능과 역할을 가진 각 요소가 일정한 원리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행위 체계를 이룬다. 그러나 파벌(派閥)은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합된 집단이다. 파벌은 폐쇄적인 동조성을 가지며 권력을 사적으로 파악해 타인이나 타집단에 대해서 대립적이며 배타적이다. 구성원과는 사적인 보호·지원 등을 하는 주종적 관계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직장인들이 조직생활에서 96%가 인맥을 중요시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맥하면 떠오르는 것이 학연, 파벌, 접대, 아부, 낙하산, 로비 등 부정적인 표현이 전체의 57%를 차지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반면 수평적 네트워크, 상부상조, 든든한 백그라운드, 인생의 보험 등 긍정적인 표현은 32%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사회생활, 즉 조직생활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아무리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직에서 어느 하나의 파벌에 속하지 못하면 외톨박이가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과 따돌림을 받으며 제거의 대상이 된다. 그 음모와 모략의 발상지가 바로 파벌이다.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들을 뽑아내듯이 악수를 두는 것이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 상대나 상대 집단을 죽이는 작업에 나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쿠데타나 별반 다를바 없다.
흔히 ‘사내정치’로 불리는 사내파벌도 회사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가령 “누가 실세다””그 사람은 어느 임원 라인”이란 식의 얘기가 나돌면 그 조직이 병(病)들기 시작했다는 징조다. CEO를 대체하는 실세가 나오면 그 회사는 방향없는 혼란과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과거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비서실장의 무소불위의 파워를 구사하는 소문이 돌자 가끔 혼자만의 스케줄로 비서실장을 당황스레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종차별과 실업을 들었는데 유독 우리나라 젊은이들만이 학력에 따른 차별을 든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대학의 젊은 교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대학내 파벌, 곧 학벌을 든 것을 보면 학력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비중을 가늠하게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원칙과 도덕성이 땅에 추락하고, ‘제 몫만 챙기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패거리’의 이익만 추구하는 ‘황량한 무대’위에 내팽개쳐져 있으며, 그 세력 다툼 속에 희생자가 돼가고 있다. 정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그만한 회사나 대학사회마저 파벌과 친분으로 패거리 짓기를 계속한다면, 그 회사나 나라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회가 민주화된다고 해도 조직 내 위계질서가 남아있는 한 누구도 명령을 하거나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파벌이 존재하는 한 모든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할 수 밖에 없어 진정한 개혁과 민주화, 그리고 자기가 속한 회사의 발전은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과 도덕성을 바탕으로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구성원과 함께 조직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나 CEO야말로 지도자의 빈곤에 허덕이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마디로 파벌없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것이 무리한 기대일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02 15:49
2025.12.02 15:49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