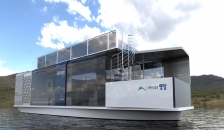|
그 얼굴을 본께 차마 못 죽겄드만”
나주 왕곡이 고향인 할머니가 가마타고 시집오던 때가 열 다섯살(15). 할아버지는 두 살 연하인 열 세살(13) 이었다. 혼례 후 2년간 신랑 신부가 말한마디 하지 못했고 잠도 함께 자지 못했다.
“쬐깐헌(작은) 남편 얻어서 고생 퍽 혔어”라고 말을 시작한 이공례(92) 할머니는 벌써부터 눈시울을 붉어졌다.
시어머니 심술과 구박에 적잖이 시집살이를 했던 할머니는 시집살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을 달래주거나 자신 편을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어리고 철없는 어린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이 할머니 시집살이에 마을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까지도 “며느리 오래 못살겠다”고 걱정을 하곤 했다고. 시어머니 심술과 구박은 말할 수없는 설움이었다.
하소연할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고달프던 시집살이 못견뎌 죽으려고 작심한 때도 있었다.
“시암(우물)에 빠져 죽을라고 시암가에 가서 물을 내려다 본께, 시암물에 내 얼굴이 빼난허게(훤하게) 비쳐… 그 얼굴을 본께 차마 못 죽겄드만, 그래서 치마를 머리에 둘러쓰고 빠질려고 발버둥쳤는디 못 죽었어…”
“내가 시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터이니 이집 구신이 될때까지 살아야 겄다는 오기가 생기더만” 가장 참기 힘들고 서러웠던 건 배고픈 설움이었다.
“논일, 밭일 일은 많이 혀서 배는 고픈디 시어머니가 밥을 쬐끔만 줘…” 못내 서러운지 눈물을 찔끔거리시는 이 할머니.
쌀 항아리 있던 곳간 문 잠그고 열쇠를 꼭 감추고 있던 시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곳간 문을 열어 직접 쌀을 꺼내 줬다.
곳간에 쌀은 넘쳐났지만 시어머니가 내준 쌀은 항상 부족했다. 밥상 위에서도 며느리 밥을 덜어 아들 밥그릇에 올려주는 시어머니, 아들이 그 밥 다 먹을 때까지 눈 부라리며 지켜보던 시어머니보다 아무말 못하고 그 밥 다 먹어치우는 어린 남편이 더 미웠다.
“결혼허고 3년쯤 지났던가 남편이 혼자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 몰래 밥을 냉기더니(남기더니) 밥상을 뿔껑(불끈) 들어서 문밖으로 내주더만… 부엌에 앉아 그 밥 먹는디 눈물이 얼매나 흐를 것이여…”
아들 둘, 딸 넷을 낳았다. 며느리에게 그렇게 야박스럽던 시어머니는 손자 손녀 만큼은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었다고.
서러운 시집살이였지만 시어머니를 더이상 미워하지 못하고 공손하게 모셨던 이유가 그것이었다.
“애 낳고나면 젖 많이 나오라고 밥을 많이 주시더만… 애들을 그렇게 이뻐할 수가 없었어, 그게 좋아서 시어머니를 공경했제”
어머니 시집살이 지켜보며 컸던 큰 아들이 할머니를 가장 불쌍히 여겼다고 한다. 그런 큰 아들이 3년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먼저 간 큰 아들이 눈에 밟힌다.
8년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지만 신북에 사는 큰 딸(이봉님)이 자주 들여다보며 봉양한다. 아흔 둘 나이에도 귀 밝고 눈 밝고, 아프신곳 없이 정정하신 할머니는 유모차를 밀고 항상 운동을 다니신다.
“운동 안허먼 다리에 심이 없어, 다리 심 기를라고 운동혀”
“할머니 오래 건강하세요”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25.11.19 11:52
2025.11.19 11:52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