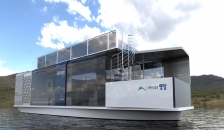|
남성우월주의 통렬한 비판
‘여성주간(7월 1일~7일)’이다. 남녀평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고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주간. 늦었지만 여성주간을 맞아 기억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 지난해 여름 적잖은 화제를 모았던 ‘님은 먼곳에’(Sunny, 2008년 7월 개봉, 이준익 감독, 수애, 엄태웅, 정진영 주연).
단순한 신파같은 멜로물은 아니다. 여성으로서 존재의 가치와 자아를 찾는, 반면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영화다. 개인적으로 페미니즘(feminism 여권확장론)을 표면에 드러내고 과제를 제시한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이다. 감독도 시사회에서 “이 영화는 철저한 페미니즘 영화”라고 밝혔었다.
포스터에서는 수애가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있네? 호~. 게다가 영화 ‘왕의 남자’로 유명한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라니. 이만하면 볼만한 영화지 않은가.

1970년대 치열한 월남전. 그 전쟁터에 순진하고 순하기만한 시골 아낙네이자 종갓집 며느리 순이(수애 분)가 한국군으로 참전한 남편을 찾으러 갔단다. 이준익 감독은 남자로서도 살아남기 힘든 그 치열한 전장 한 가운데에 나약한 한 여자를 등장시킴으로써 ‘페미니즘’을 풀어나간다.
순진한 시골 아낙네 순이는 왜 월남에 남편을 찾으러 가야만 했을까? 영화 전반부에서는 70년대 한국 사회상을 빌어 그 시대 힘겨웠던 여성의 삶을 고발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달거리까지 손꼽으며 매달 군대간 아들에게 면회를 가라고 성화다. 삼대독자 외아들의 씨를 받아오라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사대부 종갓집 대를 이을 자손이 중요할 뿐이니….
아들 면회가는(씨 받으러 가는) 며느리에게 “상길이 술 많이 못먹게 하고”라든가 “내는 첩자식으로라도 대를 이을끼다”라는 대사에서 시어머니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
“첩하고 본 부인하고 같나?”라는 시어머니의 엄한 꾸중에서나 “한번 시집갔으먼 니는 죽어도 그집 귀신이다”는 친정 아버지의 말에서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종갓집 며느리의 본분과 희생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숙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상길(엄태웅 분)은 면회 온 아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상길은 대학시절 사귄 애인이 있었고, 부모 명을 거역할 수 없는 종갓집 삼대독자로서 어머니가 짝지어준 아내와 애정없이 결혼했을 뿐이다.
순이와 상길이 마주 앉은 여관방. 술 잔을 사이에 두고 상길이 묻는 말 “니 내 사랑하나”, “니 사랑이 뭔줄 아나”, “…” 상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순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순이가 월남에서 부르는 그 노래 가사는 그 순간 대답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노래한 것이라든가, 남편을 만나 꼭 하고 싶은 말 따위로는 결코 해석하지 말것. 그렇다면 통속적인 멜로물로 전락해버릴 테니까.
이 장면과 영화의 마지막 장면-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반쯤 넋이 나간 상길의 뺨을 순이가 울면서 때려대는 장면-을 연결시켜보자.
“찌질한 남자들…, 니들이 사랑을 알아? 니들 사랑만 소중하고, 대 이을 씨만 소중하니? 내 삶과 가치도 소중해”라고 항변하듯 순이의 손을 통해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적 사회상에 통렬한 채찍을 가하는 것으로 이해 했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결론을 너무 빨리 말해버린 것 같다.
영화는 순이가 남편을 찾으러 험한 곳에 갔던 ‘이유’보다는 남편을 찾는 ‘과정’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남편을 찾는 과정이 곧 순이가 자아(自我)를 찾는 과정이다. 처음부터 목적은 아니었지만 점차 자아에 눈을 뜨고 한 인간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베트콩 지휘관이 가슴에 총을 겨누는 순간에도, 생과 사의 갈림길 절박한 상황에서도 순이의 대답은 단호하기만 하다. “남편 만나러 왔어요!”
남편 찾는 길이 어려워질수록 순이의 목적은 더욱 뚜렷해지고 집념은 더욱 강해지고 불타오른다.
순진한 시골 아낙네 ‘순이’는 공연이 거듭될수록 점점 독기를 품은 ‘써니’로 변해간다. 첫 공연에서 픽사리 내고 야유를 받던 순이가 핫팬츠를 입고 노래하며 장병들에게 속옷을 던져주는 파격적이고 과감한 ‘써니’로….
오로지 포기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서, 꼭 남편을 찾고야 말겠다는 집념때문에, 한 여자로서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 되겠기에.
미군들 사이에서 술을 마셔가며 독기서린 눈빛으로 ‘수지 큐’를 부르는 써니의 모습은 관객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차라리 처연하다. 다음 순간 써니가 미군장교에게 몸을 파는 뜻밖의 상황 설정에 관객들은 심기가 불편하다.
“시어미 성화에 등 떠밀려 사랑하지도 않는,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는 남편 찾으러 갔으면, 적당히 찾는 시늉만 하다가 몸성히 집에 돌아오면 될 것이지, 누가 미군한테 몸까지 팔아가면서 남편 찾으라 했니?”
그러나 앞서 말하지 않았던가. 이준익 감독은 1970년대 그 시대에, 남자들의 전유물인 치열한 전쟁터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 여자를 등장시키는 픽션(fiction 허구)으로 패미니즘을 풀어간다고.
“이것이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어쩔수 없잖아…” 써니가 작심한듯 미군장교 방문을 안에서 잠궈버릴 때는 차라리 눈물겹더라.
“남자들 너희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달성을 위해 전쟁을 하고, 돈 뺏고, 몸 뺏고, 온갖 찌질한 짓을 다하면서도 우쭐대는 너희들이 혐오스럽다. 너희들처럼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겠다는데, 여자인들 못할게 있느냐?”라고 항변하는듯 하다.
그러나 이부분 써니는 그러한 남자와 타협해 버리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부분 기자도 좁은 지면에서 설명하기가 난감하다. 감독이 던져주는 과제라고 넘겨버리면 쉽다.
이 장면의 연결고리를 찾자면, 사이공 시내 한복판에서 폭탄테러 직후 미군 총에 맞아 죽어가는 한 베트콩 여인의 눈과 마주친 순이의 눈이다. 그 순간 순이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저 여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저렇게 목숨까지도 버리는 걸까?”라고.
“내가 이곳에 온 목적, 남편을 찾지 못하고서는 죽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써니의 존재 가치다. 치열한 전쟁터에 내던져진 나약한 한 여자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숨기고 살아야했던 한국 여성들의 자아를 찾으려는 몸짓이다.
“고작 남편 뺨 몇대 때릴려고 그 험난한 전쟁터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남편 찾았니? 쳇!”라고 투덜거리며 자리 털고 일어서는 관객에게 말하고 싶다.
이건 신파가 아니다. 순이가 때리는 따귀의 의미는 애정도, 애증도 아니다. 그 시대 가부장적인 사회상과 권위를 상징하는 남편 상길에게, 아니 찌질한 남자들에게, 한 여성이 가하는 매질이다. 이준익 감독이 사회에 던지는 신랄한 비판이고 냉소이면서….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25.11.19 10:35
2025.11.19 10:35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