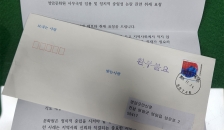생전에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을 깍듯이 대했다고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종종 ‘YS’라고 호칭했지만 측근들과의 자유스러운 대화에서조차 단 한 번도 김 전 대통령을 ‘DJ’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 전한다. 한 측근이 대화도중 자신도 모르게 ‘DJ’라고 말하자 노 전 대통령은 그를 빤히 쳐다봤다는 일화도 있다. 그 측근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민망했었으리라.
2003년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다 실신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의 원통함과 분노는 극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주치의가 달려오고 가까스로 진정한 김 전 대통령은 휠체어에 실려 아무도 모르게 청와대를 빠져 나갔다. 이 때 노 전 대통령은 현관 앞까지 달려 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한동안 어찌할 줄 몰랐다고 한다.
이런 노 전 대통령에게 김 전 대통령 역시 극진했다. “전생에 친형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 두 전직 대통령은 가슴에 새길만한 명연설로도 공통점이 있다. 특히 1988년7월8일 노 전 대통령이 초선의원으로 국회본회의장에서 했던 연설은 요즘의 집권층에 만연한 몰염치에 대한 불호령처럼 떠오른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01 09:57
2025.12.01 09:57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