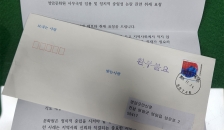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
군서면 도장리 출신
미국 영암홍보대사
아내가 라면을 끓여 내왔다. 라면이란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의 풍경이 떠오른다. 보리타작 하던 날이었다.
산천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필 무렵 보리가 패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보리밭은 파도처럼 일렁이며 들판을 건너갔다. 보리모가지가 올라올 무렵, 연초록 물결이 언덕을 굽이치며 넘어가는 풍경은 장관이었다. 이맘때쯤이었을 것이다. 열일곱 어린 농사꾼이었던 나는, 넘실대는 청보리 물결을 따라 어디론가 한 없이 흘러가버리고 싶었다.
피어나는 보리모가지를 쓰다듬으면 보들보들한 감촉이 손바닥을 간질였다. 그 부드러운 털 깊은 곳에 알맹이가 숨어 있었다. 붓처럼 휘어지던 가는 털이 까슬까슬 하다가, 빳빳해지고, 창끝으로 꼿꼿하게 서는 날이면 보리가 익었다. 나락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만 보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뙤약볕을 견디며 누렇게 익어가던 보리, 보리들. 아, 그 당당함이라니!
보리가 익으면 낫을 들고 따가운 햇볕 아래 보리를 베었다. 베어놓은 보리를 한 단씩 묶어, 지게에 져서 집으로 날랐다. 걸음을 옮길 적마다 보릿짐은 출렁거리고 창끝 같은 보리까시락이 난닝구에 달라붙어 등허리를 찔러댔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언덕을 오를 때는 가슴이 메이고 숨이 턱턱 막혔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 내야만 했다. 그것이 농부의 삶이었다.
집 마당에 홀태를 차려놓고 일일이 보리모가지를 땄다. 몇 날 며칠을 온 식구가 홀태에 달라붙었고, 따 놓은 모가지를 마당 한쪽에 쌓아두었다.
보리타작 하는 날은 아침부터 바빴다. 쌓아놓은 보리모가지를 마당 가득 널었다. 해가 중천에 올라 모가지가 바삭바삭 할 정도로 잘 마르면 타작을 시작했다.
초보 농사꾼인 나는 도리깨일이 서툴렀다. 그때마다 아재는 “도리깨질은 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랑께, 나긋나긋 도리깨를 따라가는 것이여” 하고 나를 가르쳤다. 그랬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거기에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숨어 있었다.
보리타작은 품앗이를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 한 사람이 앞장서고, 남은 사람은 그를 따라가며 도리깨질을 했다. “여기, 저기, 어야, 디야,” 도리깨가 춤을 추며 바짝 마른 모가지를 두드리면 까시락은 여지없이 문드러지고?토실토실한 보리알이 오지게 떨어져 허기진 마당에 그득히 쌓여갔다.
그렇게 한 바탕 두드린 다음,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은 꿀맛이었다. 그 날, 어머니가 영암장에 다녀오시더니 “아야, ‘라면’이란 것이 나왔더라 잉”하시며 새참거리로 끓여 내왔다. 그 꼬불꼬불하고 간간하고 매끈매끈한 국수를 닮은 음식, 라면을 그때 처음 먹었다.
등짐이나 보리타작을 한 날은 밤새 끙끙 앓았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스물한 살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어 고향을 떠났다. 되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농사 경험이 두고두고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 시절은 씨 뿌리고 김 메고 거두어들이는 거의 전 과정을 몸으로 해냈다. 이를테면 나는 재래식 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마지막 농사꾼이었다.
라면 한 그릇이 아득한 추억을 불러왔다. “도리깨질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랑께”하시던 아재의 말씀이 생각난다. 보리타작 풍경 속에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02 10:37
2025.12.02 10:37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