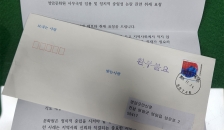선거가 끝나면 환호하는 이들보다 아쉬워하는 이들이 더 많다.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후보가 난립하고, 그 결과 당선자가 투표자의 과반수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반대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의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실망감에 고향을 떠나고 싶거나, 심지어는 이민을 가고 싶다는 이들도 있을 정도니 투표에 숨겨진 ‘다수결의 원칙’은 결코 ‘최선’도 아닐뿐더러, 유권자들을 울고 웃게 하는 애물단지이지 싶다.
결코 최선일 수가 없는 투표의 문제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또는 ‘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s paradox)’이다. 이는 18세기 후반 콩도르세가 지적한 것으로, 단순 다수결을 통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예컨대, 선거에서 한 지역구에 출마한 A, B, C 세 후보자 득표율을 집계한 결과 A가 41%, B가 32%, C가 26%였다. 당연히 41% 득표율을 얻은 A가 당선의 영예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과연 최선이었을까? 아니었다. 사전에 A와 B, B와 C, A와 C의 가상대결을 전제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B와 C가 모두 A를 꺾는 것으로 나왔다. 즉 B와 C를 지지한 유권자(58%)는 모두 A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후보 모두 출마하면서 A를 싫어하는 유권자의 표가 B와 C로 분산되는 바람에 A가 어부지리로 당선된 것이다. 이에 B와 C를 지지한 ‘다수’의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에 참담함을 느낄 수도 있다. 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번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처럼) 후보단일화가 있겠지만 이 역시 B와 C 중 누구로 단일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다. B와 C가 대결해 B를 단일후보로 정해놓았지만 A와 B, A와 C의 대결 가운데 오히려 C가 압도적으로 A를 이길 수도 있기 때문(B의 지지자는 쉽게 C의 지지자로 옮겨갈 수 있으나 반대일 경우 오히려 C의 지지자들이 B가 아닌 A의 지지자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투표의 역설을 해결하기위해 여러 제도와 장치가 고안됐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결선투표에서처럼 투표가 지닌 한계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6·4 지방선거 당선자들 역시 결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투표의 결과이니 만큼 마냥 승리의 쾌감에 도취되어선 민심을 잃기 십상이다. 당선자들이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일은 반대표다. 비록 자신에게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았으나 모두가 똑같은 유권자요, 투표였기에 선택해야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심(民心)은 움직이기 마련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02 10:37
2025.12.02 10:37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