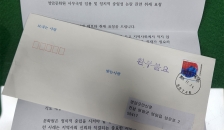1897년 독일 라인란트에서 출생한 괴벨스는 아버지가 직물공장 직원이었던 가톨릭 집안의 다섯 자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굽어 병역을 거부당하기도 했지만 어릴 적부터 천부적인 달변가였다고 한다. 가톨릭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본·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독일문헌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1922년 나치스에 들어간 그는 1925년 당내 좌파지도자 슈트라서의 비서가 된다. 하지만 슈트라서와 히틀러의 대립이 심각해지자 1926년 히틀러에 충성을 맹세하고 베를린 지방의 당 지도자가 된다.
1928년 국회의원, 1929년 당 선전부장으로 교묘한 선동정치를 통해 1930년대 당세 확장에 크게 기여했고, 결국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잡자, 국민계몽선전장관, 문화회의소 총재가 된다. 그가 선전장관이 되기까지 여정은 험난했다. 타고난 달변에 피해를 본 많은 정부 관료와 경찰 간부들이 그를 명예훼손혐의로 수없이 고발했다. 많은 벌금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다. 심지어 프로이센의 내무장관 제페링은 그를 상대로 반역죄 소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입과 교묘한 선동정치는 막을 수가 없었다.
괴벨스가 당시 언론매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라디오였다. 1934년부터 1935년까지 국가보조금을 지급해 노동자들이 35마르크만 내면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35마르크는 당시 노동자들의 일주일분 평균급료였다. 독일인들은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싼 라디오를 갖게 된 셈이었다. 그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보급된 라디오를 활용해 매일 저녁 7시 뉴스에 ‘오늘의 목소리’라는 코너 등을 신설해 수상 관저 르포를 하게 했다. 저녁이면 횃불행렬 실황을 전국에 생중계하기도 했다. 라디오를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한 그였기에 독일인들은 라디오를 '괴벨스의 입'이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최후까지 히틀러를 보좌한 괴벨스는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날 총리 관저의 대피호에서 아내와 6명의 아이들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한다. 타고난 정치선동가인 괴벨스의 행적을 담은 랄프 게오르크 로이트의 평전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1990)은 아마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이면 곁에 두고 읽고 싶은 책일 것이다. 특정 정치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거나, 특히 독재 권력의 지도자라면 군침을 흘릴 것이다. 괴벨스의 선전술은 독재자의 '성공한 不義'를 절묘하게 가려줄 것이고, 더구나 언론을 권력의 이해에 맹목적으로 복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대중은 지배자를 기다릴 뿐, 자유를 주어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그 다음 의심받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대중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 잊어버린다.' '대중의 감성과 본능을 자극하라.' 괴벨스가 남긴 무수한 어록(語錄)가운데 요즘 정치상황에 딱 맞는 몇 구절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02 09:43
2025.12.02 09:43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