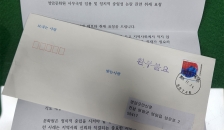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온 길에 남긴 발자국을 보며 사람들이 무어라 말해줄까 궁금했다. 그리고 문득, 산티아고 길의 택시운전사가 생각났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시작한 날, 불란서 생장피에드포르를 출발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론센스바예스까지 걸어갈 예정이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순례자 사무실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 산등성이로 가지 말고 골짜기 길을 걸어가라고 순례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었다. 한 달 전에도 산을 넘던 순례자 한 명이 눈보라 속에 길을 헤매다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윗길과 아랫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에 섰다. 순례자들이 골짜기길을 택하고 있었다. 어느 길로 가야하나. 아내가 “피레네 산맥을 넘고 싶지만 당신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잠깐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산을 넘기로 결단했다. 길에서 만난 한국 남학생이 합류했다. 셋이서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고개를 바로 들 수가 없었다. 길이 가파라지자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 걷는 사람은 우리 뿐이었다. 눈보라가 몰아쳤다. 세 시간쯤 걸었을 때 길가에 카페가 보였다.
들어가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데 우리 보다 3시간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눈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며 되돌아오는 게 아닌가. 얼마 후 또 다른 그룹 3명도 눈을 털면서 카페로 들어왔다.
카페에 머물던 아홉 사람이 논의한 끝에 택시를 타고 아랫길로 내려가 거기서 론센스바예스를 향해 걷기로 했다. 카페주인에게 부탁하여 택시를 불렀다. 20여분 택시를 타고 골짜기 길로 내려왔다. 그런데 우리를 내려놓은 택시 운전사가 택시비를 받지 않으려했다. 돈을 주려고 했지만 괜찮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렇다면 이름이나 알자며 이름을 물었지만 “부엔 까미노(좋은 순례길 되세요)”라고 인사를 던지더니 수줍게 웃으며 도망치듯 떠나 버렸다.
세상에 이럴 수가! 지나가는 택시를 손들어 세운 것도 아니고, 전화를 받고 산중턱까지 손님을 실으러 온 영업용 택시가 돈을 받지 않다니. 이름 남기는 것조차 거절하다니. 길가에 선 우리들 아홉 명은 그가 사라진 쪽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40대 중반쯤의 조용히 웃던 운전사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 뿐만 아니라, 그 때 택시를 타고 갔던 아홉 사람에게 그 운전사는 산티아고 길과 함께 오래 기억될 것이다.
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는다. 우리가 살아온 길도 되돌아보면 제각기 다른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우개로 박박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고, 생각하면 할수록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도 있다.
개가 달려가면 매화꽃잎 떨어지듯(拘走梅花落), 살아온 길목에 꽃을 피워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어떤 발자국을 남겼을까. 그리고 어떤 무늬를 남길 수 있을까, 궁금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02 09:00
2025.12.02 09:00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