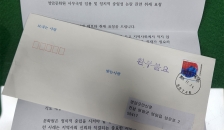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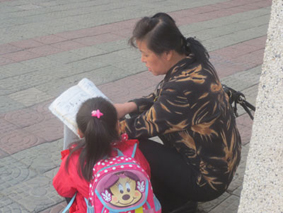
남한은 쌀이 주식인데 북한은 감자가 주식이다. 그런데 북한의 단위면적당 감자 생산량이 남한의 절반이라고 한다. 기후나 토질이 다르기 때문인 모양이다.
최근 남한에 도토리 만한 씨감자를 만들어 감자를 생산하는 ‘범용기술’을 개발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북한의 감자 생산이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였다. 북한 식량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통일씨감자재단”을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다려볼 일이다.

숙소에 들어와 보니 누군가 방에 쑥을 가져다 놓았다. 아침에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종업원에게 얘기했는데 쑥을 피우면 좋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통에 담긴 쑥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나 번져간다. 함흥 호텔에서 더운 물 두 통을 가져다 놓았던 일이 떠올랐다. 신통하게도 모기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모기에 물릴 걱정 없이 잠을 잘 잤다.
만수대 창작사 방문

창작사 앞에 도착했다. 정문 공터에 학생들이 앉아있다. 단체관람 온 모양이다.
안으로 들어가 걸어가는데 오른쪽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말 탄 청동상이 보인다. 그 앞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홍일점인 여학생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예쁘다.
청동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앞발을 든 말 엉덩짝의 근육이나 말 탄 사람의 표정에 생동감이 넘친다. 스페인 여행 중 꽤 많은 청동상을 보았는데 그것들에 못지않게 잘 만든 작품이다. 화가 이중섭이 그린 ‘황소’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사실감이 전해온다. 좋은 예술 작품은 저렇게 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새 건물을 짓고 있다. 3층 건물이다. 일하는 사람들도 감독관도 군인이다. 험산에 길을 내는 일도 군인들이 맡아 했다고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건설을 군인들이 해내는 지도 모르겠다.
전시관을 먼저 방문했다. 정문 앞에 호랑이 조각을 세워놓았다. 이 조각은 어느 음식점 앞에 서 있던 조각처럼 조악한 느낌이 든다.
아래층 꽤 넓은 전시장 벽에 그림들이 차례로 걸려있다. 언젠가 미대 교수인 친구가 그림을 보는 요령을 설명하면서, 전시장에 가면 어떤 게 내가 가져다 집에 걸어놓고 싶은 그림일까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다.
‘소꼽동무’라는 그림 앞에 섰다. 안금성 화가가 2012년에 그린 그림이다. 두 아이가 무릎치기를 하고 있다. 어릴 적 저 놀이를 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빨강 모자를 뒤로 눌러쓰고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아이의 표정이 실감이 난다. 장난 끼 섞인 웃음을 웃으며 만면에 홍조를 띄었다. 상대방 아이는 옆얼굴만 보이지만, 그 또한 만만치 않겠다는 느낌이 전해온다. 두 아이 사이에 서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채 손을 무릎에 얹고 심판을 보는 아이. 웃을락 말락 하면서도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함께 바라보는 개의 시선도 재미있다. 무엇보다 옆에 서 있는 나무. 푸릇푸릇 싹 터오는 이파리, 그리고 파릇한 잔디밭이 풋풋한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 듯 책가방이 나무 옆에 놓여있다.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 짓을 했던 일이 떠오른다. 오랫동안 그림 앞을 떠나지 못했다.
다음은 ‘고전무용 탈춤’이라는 제목이 붙은, 김승희 화백이 2008년에 그린 그림이다. 탈바가지를 쓴 무용수가 금방이라도 “얼쑤, 조오타” 하며 그림으로부터 몸을 흔들며 튀어 나올 것만 같다. 짚신을 신고 한 발을 든 채 양손을 허공에 두고 너울너울 춤을 추는 모습에 나도 춤판에 뛰어들어 한바탕 노닐고 싶다. 탈춤의 본고향 황해도 봉산 출신 춤꾼인 모양이다. 한복 위에 걸친 저고리 색동끝자락이며 휘날리는 남색 허리띠하며, 고동색 가면까지 색감 또한 보는 이의 시선을 잡아끈다.
다음 그림. 제목을 적어오지 못했지만 ‘고향 가는 길’ 쯤이면 어떨까. 소나무 세 그루가 보이고 그 옆에 염소가 풀을 뜯고 있다. 포장되지 않는 길을 따라가면 시냇물이 나온다. 저 냇물을 건너면 우리 마을이다. 징검다리가 놓여 있다. 돌다리를 건너다 발을 헛딛어 미끄러지기도 했다.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 바지자락을 걷어 올리고 신발을 벗어 들어 건너던 냇물이다. 저 냇가 둑을 따라 산모롱이를 돌면 우리 동네다. 마을 입구 텃밭에서 하얀 수건을 쓰고 밭을 매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던 우리 어머니. 오늘도 나를 보자 수건을 벗어 옷을 탈탈 털면서 걸어 나와 “아이구 내 새끼, 공부하느라 애썼네” 하시며 나를 보듬어 꼬옥 껴안아주실 것만 같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나도 고향을 떠났다.
사실 나는 그림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대저 예술이란 게 별거든가. 음악을 듣거나 문학작품을 읽고 나서 우리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어 놓은, 감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림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은 작품이 아닐까.
도자기 명인, 우치선 선생을 만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02 08:17
2025.12.02 08:17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