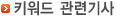|
이정훈 신임 문화원장께서는 오랜만의 산행이라 걱정을 하면서도 칠치를 다시 볼 수 있음에 설레고, 그림을 그리는 김준권 화백께서는 친구분이신 문화원장 덕분에 월출산의 비경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화구를 챙겨 칠치폭포의 스케치를 준비한다. 길 안내를 맡아 나서게 된 이 사람도 벌써 고향 영암에 돌아온 게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동안 수많은 월출산 산행 중에서도 오래도록 기억될 한 장면이 될 것을 기대한다. 좁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없었다면 거짓이다. ‘하늘 아래 첫 부처길’이 개통되기 전 단체산행을 이끌다 늘 다니던 길도 잠깐 방심한 사이 헤매던 기억이 생생한 터라 무더운 날씨에 선배님들 고행길은 만들지 말아야 할 텐데 하며 나섰던 길이다.
기도원에서 입구를 찾아 들어가니 1년여만인데도 길이 그리 낯설지 않다. 두 분 선배님들의 좋은 기운이 희미한 산길을 훤히 터주는 듯하다. 50여 분을 쉬엄쉬엄 올라가니 가느다랗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첫 번째 폭포에 다다랐다. 산행에 나섰던 그 주는 장마가 끝나고 일주일여 비가 없어 물줄기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폭포라고 작은 소리를 내주고 있다. 폭포 왼쪽에는 마치 안내판인 듯 널찍한 바위가 폭포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다. 폭포를 지키는 든든한 무장의 칼처럼 느껴진다. 10여 미터 직각의 폭포 위로는 경사진 암반을 따라 미끄럼틀을 타듯 내려오는 무지갯빛 물방울들이 서로 희롱하며 쏟아진다. 작가님은 빠른 손놀림으로 먹물을 이용하여 20여 분만에 첫 폭포를 스케치한다.
폭포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조심스레 돌아 올라가는 길을 찾는다. 미끄러운 구간이라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여 조심조심 올라야 한다. 잠깐 가파른 길을 오르면 첫 폭포와는 다른 멋을 품은 두 번째 폭포를 만날 수 있다. 폭포 앞에는 작은 웅덩이도 있고, 앉아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올라온 길을 반추하며 건너보면 맞은 편 산등성이에 칠치폭포가 한눈에 보인다는 전망대가 있다. 우렁찬 물줄기 때문에 폭포는 남성성을 상징한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폭포는 여성성을 상징한다는 작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첫 번째 폭포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두 번째 폭포에는 아직은 젊고 파릇한 여성의 앙다문 표정이 보인다.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작가의 손놀림은 여기에서도 거침이 없다.
세 번째 폭포를 만나기 위해서는 폭포를 바라보며 왼쪽으로 올라서야 한다. 두 번째 폭포를 만나러 가는 길보다 더 가파르다.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겨우겨우 올라섰던 기억이 생생한데 누군가 튼튼한 슬링벨트 같은 것을 길게 매달아둔 덕에 예전보다 쉽게 올라설 수 있었다. 벨트에 의지하여 겨우 올라선 후, 보타진 숨을 고르며 너덜길을 따라 좀 더 올라서면 인생의 깊이를 알고 있는 농염한 여인을 만날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 소견이지만, 이 폭포는 칠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오래도록 보고 있으면 억겁의 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들려주는 듯하다. 세 번째 폭포까지 올라선 허덕거림도 작가님의 집중을 앗을 수는 없다. 긴 물줄기를 빨아들이듯 응시하며 붓의 움직임은 더욱 현란하다.
이제 가장 위험한 코스를 지나야 하는 마지막 폭포를 보러 간다. 웬만한 사람은 밧줄이 없다면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없다. 배낭에 미리 밧줄을 챙겨갔는데 다행히 누군가에 의해 두 가닥의 밧줄이 내려져 있다. 위험한 구간이라 중간에 서서 두 선배님을 밀고 당겨서 구간을 통과한다. 좁은 암반을 조심스레 지난 후 다시 너덜길을 따라 좀 더 올라선다. 개인적으로 작은 ‘이구아수’ 폭포라 명명한 마지막 네 번째 폭포를 만난다. 이곳은 큰비가 오고 나면 암반 전체가 폭포가 되어 남아메리카의 유명한 이구아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장마가 막 끝난 후에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 폭포여서인지 하늘이 훤히 열리고 폭포의 은밀한 매력은 덜한 곳이다. 어느새 작가님은 마지막 폭포의 스케치를 마친다.
네 군데 폭포를 스케치하는 작가님의 열정과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양의 빛을 그린 천재 Vincent Van Gogh를 떠올린다. 고흐 등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주장하였던 “en plain air”(현장에서 그리기)는 아니지만, 작품의 영감과 생동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고, 또 붓을 들고 수묵으로 순간적으로 스케치해나가는 모습에 왜 ‘김준권’이란 사람이 이 시대의 독보적인 작가인지를 실감한다. 대상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는 것은 대상과 가벼운 접촉만 이루는 것이지만, 스케치는 그 대상과 완벽한 ‘교합(交合)’을 이루는 것이라는 작가님의 설명을 듣는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고흐도 현장과 완벽히 교합하며 ‘태양의 빛’을 찾아냈을 것이다.
폭포를 지나 매봉 아래 사자 저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바위를 오른 후, 계곡을 따라 한참 오르다 보면 의외의 장소에 마애불이 새겨져 있다. 용암사지 위에 있는 국보 제144호 마애여래좌상과는 품격은 다르지만, 고려 중기 이후 양식인 소박하고 해학적인 모습의 부처님이 앉아 있다. 월출산에서 가장 기가 세다는 곳 중의 한 곳이다. 과거 영암 선배 중 월출산 곳곳에서 비박을 하며 사진을 찍던 분이 계셨는데, 이곳에서만은 새벽이면 천둥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해야만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부처님께 합장하고 무사히 올라왔음에 감사를 드린 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한다. 왔던 길로 되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계곡을 올라 구름다리 코스를 타고 하산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미 지친 두 선배님에게는 이게 너무나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200여 미터 계곡 길만 오르면 정규 등산로를 만나게 되니 큰 무리는 아닐 것이라 여겼는데, 이미 지친 상태에서 길도 없는 곳을 헤치며 가파른 길을 오른다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다. 다행히 헤진 몸을 추스르며 한발씩 나아가 정규 코스의 경계에 둘린 난간에 기대어 거친 숨을 다소나마 돌린다. 정오가 다가오자 기온은 35도에 육박하는 불볕이 되었다. 몇 해 전 한여름 북한산 종주 때 백운대 정상 온도가 35도였음이 떠오른다. 그때의 그 열기를 다시 월출산에서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천천히 구름다리를 건너서 하산한다. 오전 7시 30분쯤 시작된 산행은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평소보다 더 힘들었던 칠치폭포 여정이었지만, 이정훈 문화원장님의 첫 월출산 문화 답사길을 안내할 수 있었고, 김준권 화백님의 스케치 산행에 동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12.15 17:13
2025.12.15 17:13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