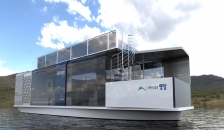|
LA남부한국학교장
군서면 도장리 출신
토요일 아침,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뒤뜰 매화를 바라본다. 꽃망울이 톡톡 피어나는가 싶더니, 참새 혀처럼 돋아나던 이파리도 어느새 떡잎이 되었다. 꽃 이파리가 파르르 떤다. 바람이 스쳐 가는가 보다. 바람, 바람... 하다가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바람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 산자락에 누워계신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어 태평양 건너 내 집 뒤뜰까지 와 꽃 이파리를 흔들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아버지가 바람으로 오시다니? 따져보면 틀리지 않는 말이다. 성서에도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 바람(숨)을 불어넣어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고 쓰여 있다.
구약 시편엔 ‘사람은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이 다하는 날,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흙을 떠난 영혼은 다시 바람이 된다. 바람이 되어 바람을 타고, 바람 따라 막힘없이 돌아다닌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어림도 잡히지 않는다.
아버지를 마지막 뵈었던 때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대학 3학년 봄이었다. 고향 집에 내려간 내가 병석에 누워계시던 아버지께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인사를 올렸더니,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고 물으셨다. 어떤 예감이 있어 그런 말을 하셨을텐데, 그 때는 몰랐다.
며칠 후, ‘부 사망 급래’라는 전보가 학교로 왔다.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던 터라 학교로 전보를 보냈던 것이다. 학과 편지함에 붙어있던 ‘정찬열 학생 전보, 서무실 확인 바람’이라는 쪽지를 친구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장남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뻔했다.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쓰겄다만, 하던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맺혀있다. 늘 그렇게 한 발자국씩 늦게 후회하며 사는 게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널 어허널...” 꽃상여 태워 개나리 핀 산천에 아버지를 모시던 날이 엊그제 인 듯싶다.
사실 나는 아버지에 관한 애틋한 추억이 별로 없다. 그 시절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와 달리 엄하고 어렵기만 한 분이셨다. 친구들 중 아버지와 친하게 지낸 아이는 드물었다.
그래서 성공은 어머니 덕택이고, 실패는 아버지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지도 모르겠다. 이해가 간다. 나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되어보니 알겠다. 아비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오후, 대학 다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아빠는 잘 있으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끊고 나서, 금방 후회했다.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잘하라’는 말, 안 하면 안 되나.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미는 일 좀 그만 하면 안 되나. 그 놈의 말, 내가 아들이래도 지겹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 녀석은 짐작이나 할런지 모르겠다. 옹알거리는 소리로 녀석이 처음 “아~빠”을 불러 주었을 때의 가슴 벅차던 순간을. 내 책상 모서리에 자주 이마를 찧던 아이가 자라 어느 날 면도기를 사달라고 했을 때 느꼈던 아비의 뿌듯한 심정을.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 이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기쁨도 슬픔도 속으로 삭여내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들을 길러보니 이제 알겠다. 내 아버지가 나를 기를 때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지켜보았는가를.
내가 오늘 창가에 서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듯, 먼 머언 어느 날. 내 아들도 나처럼 창가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보며 제 아비를 추억이라도 해 줄까. 모를 일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1.19 06:19
2025.11.19 06:19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