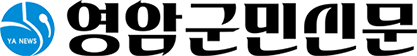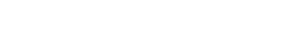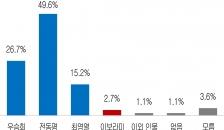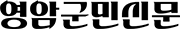|
고성 통일전망대를 바라보다

저 남쪽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이쪽 해금강을 바라보며 서 있던 때가 있었다. 국토종단을 끝낸 2009년 5월 3일, 국토횡단을 시작했던 2011년 5월 3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다.
31일 동안 걸어서 국토종단을 끝냈던 2009년 그날, 이렇게 적었다. “마침내 통일전망대에 올라섰다. 금강산이 멀리 보인다. 금 하나 그어 남쪽과 북쪽을 갈라놓았다. 바다에도 그어 놓고 우리들의 가슴에도 보이지 않는 금을 깊게 파 놓았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모습을 이곳에 와서 다시 확인한다. 북녘으로 뻗어나간 저 길, 산모롱이 따라 휘어지면서 모습을 감추었다. 보이지 않는 길, 언젠가는 내가 걸어가야 할 저 쪽을 바라본다.”

“통일전망대 도착. 두 해 전에는 국토종단 종착점이었지만 이제 국토횡단 시발점이 되었다. 종단 때, 먼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이 되살아난다. 북녘 땅이 한 눈에 들어온다. 말무리 반도. 바다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섬들이 말이 무리 지어 달리는 모양을 이루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철조망 너머는 비무장 지대다.
1950년 6월 25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3년이 넘도록 한반도에 피바람이 휘몰아쳤다. 400만이 넘는 인명피해와 1천만 이산가족을 남기고 국토의 80%이상을 파괴했다.

해안선을 따라 길이 뚫려있다. 저 길은 한 때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저 길을 따라 금강산을 다녀왔다. 지금은 적막하다. 거친 파도만 몰려왔다 몰려간다. 길은 소통을 위해 존재한다. 닫혀있는 저 길도 다시 열리고야 말 것이다. 주인을 태우고 달리는 말무리 반도의 말처럼, 저 길은 제 등을 타고 지나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날, 멀리 건너다보이던 그 곳에서, 내가 바라보았던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곳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언제쯤이나 아무런 제약 없이 오고 싶을 때면 언제나 오갈 수 있는 시절이 올 것인가.
“선생님은 아이들이 몇입네까.”
안내원이 묻는 소리가 파도소리에 섞여 들려온다. 윤 선생 같은 딸이 하나, 그 아래 아들이 있다고 대답하니 몇 살이냐고 묻는다. 스물아홉, 스물여섯 살이라고 하니 이런저런 질문이 이어진다.
온정리에도 장마당이 서느냐고 물었다. 열흘 마다 한 번, 1일에 장이 선단다. 매월 세 번씩 장날이라는 얘기다. 장마당에서 각종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월급은 얼마나 받느냐고 물었더니 3천원쯤 된다고 한다. 아버지 월급은 자기보다 더 적을지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고 얘기하며 웃는다. 어머니는 뭐하시느냐고 또 물으니, 장마장에서 장사를 하신단다.
매일 산을 오르면 신발이 좋아야 할 텐데 어떤 걸 신느냐고 물었더니, 장마장에 좋은 신발들이 많다고 한다. 신발이나 옷은 자비로 구입한다고 했다. 월급 받아서 먹고 살고 사고 싶은 물건 사는데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어케 사람이 제 욕심 다 채우고 삽네까” 어른 같은 답을 내놓는다.
장마장에서는 달러와 중국돈이 주로 통용된다고 한다. 해방산 호텔 구내매점에서 괜찮아 보이는 옷 한 벌에 $300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북한 화폐로 치면 대단한 액수다. 신고 있는 운동화를 보니 중국제품이다. 운동화 한 켤레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장마장에서 운동화는 얼마정도 하느냐고 물으니 종류에 따라 다르다며 피식 웃는다.
해금강 정자에서 어제 만났던 러시아 작가 일행을 만났다. 다시 만나니 할 말이 좀 더 많아진다. 첫 방문인데 대단히 인상적이라며 한 번 더 올 계획이라고 한다. 서로 연락하자고 또 약속을 했다.
김 참사와 운전사 방 동무는 휴대폰으로 본부와 수시로 연락을 하는 모양이다. 북한에 손전화가 370만대에 달한다니 인구에 비하면 적잖은 사람이 휴대폰을 이용하는 셈이다. 평양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편리한 물건은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다 보급되기 마련이다.
통천군 답전면 아산리

고성군과 통천군 경계를 지난다. 통천려관, 통천전당포 상호가 보인다. 정주영 회장의 생가가 통천인데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닌가 싶어 김 참사에게 “정주영 회장 생가 들려가는 거지요” 다짐을 주었다.
십여 분 지났을까, 길가 마을 앞에 차를 세운다. 이 마을이 ‘정주영 선생 생가 마을’이라고 한다.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그런데 로상리, 라는 푯말이 보인다. 로상리?,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정주영씨 생가 마을을 아시느냐고 물으니, “이 마을이 아니고, 저쪽 다리 건너 왼쪽으로 둑을 타고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해준다.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가 있어 다시 물어보았다. “저기 저 마을이 정주영 생가 마을”이라고 손가락으로 동네를 가리킨다. 그 마을 뒷산 이름이 아산이어서 정주영씨가 호를 아산으로 정했다고, 생가가 다 보존되어 있고 차로 가면 여기서 10분이면 갈수 있을 거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11:02
2026.01.03 11:02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