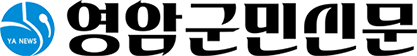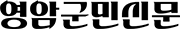|
| 김기천 전 영암군의원 |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꿈이 거대한 장벽에 막혀 있는 느낌이다. 바로 권력자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점이다. 좁은 지역에서 무슨 권력자 타령인가 싶겠지만, 아니다. 훨씬 촘촘하고 실제적인 권력자의 행세와 마주하고 사는 것이 내가 경험한 영암세상이다. 국회의원, 군수, 도·군의원, 관청의 실·과장, 조합장 그리고 그들과 연줄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그 장벽이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그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안 되는 일도 그들을 통하면 거짓말처럼 가능해진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들의 불합리와 불공정을 보고도 눈감고 상식을 벗어난 일에도 침묵한다. 밉보였다간 콧물도 없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결하려는 자들이 정을 맞아 고꾸라지고 옳은 소리에 재갈이 물려진다. 대신 접대와 선물로 권력자의 환심을 사려는 비행이 버젓이 횡행한다. 결국 권력자들은 만사형통하게 되었다. 그 권력을 잡고 또 유지하기 위해 어떤 편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대담해졌다.
몇 년 전 호주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연히 한 양이 발견되었는데 그 모습이 기이했다. 귀에 붙은 표식으로 봐서는 농장에서 탈출한 양이었는데 털이 엄청나게 자라서 걷는 일조차 어려울 지경이 되어 있었다. 털의 무게가 자그마치 35킬로에 달했다. 일반 양이 3-4킬로 수준이니 얼마나 자랐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 양의 이름이 '바락'이다. 바락이 무려 35킬로나 되는 털을 갖게 된 까닭은 간단했다. 원래 야생 양들은 매년 자연스럽게 털갈이를 한다. 그런데 양이 사람에 의해 가축화되면서 매년 털을 깎아주다 보니 스스로 털갈이하는 기능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바락의 무지막지한 털은 야생의 양이 아닌 가축으로 길들여진 결과였다. '바락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권력자들이 갖가지 보조금과 사업, 자리, 인사, 이권이란 길들임의 전신갑주를 입고 호령하는 사이, 주인이라 칭함 받는 지역민은 처지도 태도도 옹색하기 짝이 없게 돼버렸다. 선량한 양심과 땀흘려 일하는 사람의 자긍심은 후미진 골목에서 서성거리고, '줄 잘 서야 잘 산다'는 야비한 처세의 염불이 백주대낮에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이 저열한 세태를 어째야 하는가?
내가 존경하는 후배가 자주 하는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싼 똥은 우리 손으로 치워야 한다'. 시민으로서 각성 말고 마취된 정의를 깨워낼 방법이 또 있을까 싶다. 눈 부릅뜨고 살자. 좀 더디 잘 살면 어떤가? 다함께 잘 살아내는 세상을 만들 꿈을 짓는 게 훨씬 인간답다. 이 악물고 혼자서 덤비기보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고 함께 돕고 힘 모아서 외치면 마침내 새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나는 최근 아마존 밀림의 고무채취 노동자 치코 멘데스의 삶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노동자들의 터전인 숲을 지키기 위해 조합과 정당, 언론, 대학, 인디언 원주민, 해외 엔지오 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연대하며 협력을 조직했다. 비록 마흔넷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개발업자가 보낸 암살자의 총부리에 쓰러졌지만, 개인이 이룰 수 없는 일을 개개인이 연대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웅변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스토아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보탠다.
"“네게는 손이 없느냐? 직접 코를 닦아라. 그리고 신을 탓하지 말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6.01.02 10:53
2026.01.02 10:53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