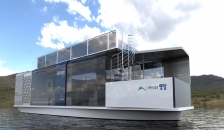|
시인
군서면 도장리 출신
미국 영암홍보대사
해창나루에 갔다. 영암읍에서 도포 쪽으로 십리쯤 가면 나오는 해창. 20년 만인가 30년 만인가. 물론 지금은 나루가 아니다. 넓고 시원한 다리가 쭉 뻗어있어, 이곳이 나룻배가 사람을 건너 주던 곳이라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산천은 의구하지 않고, 인걸도 간 데가 없다. 끝없이 출렁이던 강물은 온데 간데 없고, 그 자리에 아스라한 들판이 들어섰다.
가만히 다리 아래를 살펴보니 또 다른 다리가 걸려있다. 구 다리 위에 새 다리를 건설한 모양이다. 저 작은 다리가 걸려있던 시절만 해도 해창은 항구였다. 목포항을 출발한 영암호가 하루 한 번씩 해창을 다녀갔다. 영암호는 2,3백 명을 실을 만큼 제법 큰 여객선이었고, 영산강변 주민들이 도시로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교통편이었다. 선착장이 없는 곳은 종선이라 불리우는 작은 배를 띄워 사람과 물건을 큰 배에 싣고 내려주었다.
밀물이면 영암호가 뱃고동을 울리고 동백아가씨를 확성기로 불러재끼며 개옹 따라 올라왔다. 개펄에서 기나 맛을 잡던 아가씨들이 머릿수건을 벗어 흔들어댔고, 대갱이를 잡던 총각들은 글캥이질을 멈추고 휘파람을 불며 환호했다. 봄이면, 청춘들의 가슴은 설레었다. 그들 중 몇은 도시로 외입을 나갔는데, 영암호를 타고 떠났다. 몇 개월 뒤 풀이 죽어 되돌아오기도 했다.
저 작은 다리가 놓이기 전, 나룻배가 있었다. 그 시절에도 여객선이 다녔다. 당시 목포는 서남해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 중심지였으니까.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아버지를 따라 시종에서 군서면 장사리 큰집까지 여러 번을 댕겼다. 설날이나 할아버지 제삿날은 물론 방학 때도 갔었다. 버스가 다니지 않던 시절이라 30리가 넘는 그 길을 꼬박 걸었다. 그 때마다 해창나루를 건너야만 했다.
어린 내가 재재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아버지를 따라 간다는 게 힘들었다. 거의 달리는 수준으로 쫒아갔다. 요즈음 아버지라면 틀림없이 아이의 보폭에 맞춰 걸어 주었을 것이다. 아, 길가에 주저앉아버린 나를 아버지가 업고 가던 기억이 딱 한 번 있다. 아버지의 넓은 등에 업혀가던 때의 기분이라니! 그 후, 버스가 들어왔지만 도포면 소재지까지 하루 두세 번 운행하는 버스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여전히 걸어서 다녔다.
어느 겨울방학 때, 힘들게 걸어 해창나루에 도착했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강바람이 차고 눈발은 날리는데 몇 번을 불러도 저쪽 선창에 매여 있는 나룻배가 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손발이 시리고 어둠은 짙어 갔다. 한참 후, 강을 건널 사람이 네댓 명으로 늘어났다. 여럿이 입을 모아 “여말이요~! 사고-ㅇ, 사고-ㅇ!” 몇 차례를 부른 다음에야 나룻배가 건너왔다.
큰집에 갈 때는 거의 매번 그렇게 나룻배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뱃사공이 강 쪽으로 난 자기 집 봉창에다 유리조각을 붙혀 놓고 나루를 건널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확인한 다음, 사람이 좀 모아지면 배를 띄우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경우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고 “버르장머리가 해창 나루쟁이 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했다.
이제 해창나루는 사라졌다. 그러나 주저앉은 나를 들쳐 업고 성큼성큼 걸어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저 길 위에 남아있다. 출렁이던 물결 소리, 영암호의 고동소리와 함께 “여말이요~ 언능 좀 오쇼 잉!” 사공을 부르던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1.19 06:21
2025.11.19 06:21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