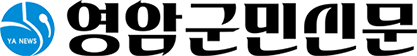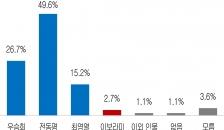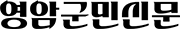|
동요 ‘고향의 봄’ 노랫말은 이원수(1911~1981) 선생이 초등학생이던 열네 살에 지었다고 한다. 프랑스 천재시인 랭보가 열여섯 살에 빛나는 시편을 썼던 것에 비해 두 살이나 어린나이에 유명한 시를 쓴 셈이다.
노래의 첫 소절은 ‘나의 살던 고향’이다. 쓰기는 그렇게 쓰고 노래로는 ‘나에 살던 고향’이라고 부른다. 국어학자들은 ‘나의 살던’이 일본식 표현이므로 ‘내가 살던’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두 말이 완전히 같은 게 아니며, ‘나의 살던 고향’이 ‘내 경우 고향에 대해 말한다면’으로 들려 더 겸손한 맛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 노래는 한때 국민애창곡 중 하나였다. 그런데 선생의 친일 전력이 알려지면서 그 빛을 많이 잃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랭보는 열아홉에 시 쓰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서 ‘바람구두를 신은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유랑했다. 그는 프랑스 상징주의 대표 시인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래서 이원수 선생은 친일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알다시피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홍난파(1898~1941) 선생이다. 홍난파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로 봉선화, 성불사의 밤, 고향생각 등, 가곡은 물론 많은 동요를 작곡하면서 천재 작곡가로 불렸다. 그가 죽은 다음, 그를 기리는 사람들이 ‘난파기념사업회’를 만들어 1968년 ‘난파 음악상’을 제정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작곡가 류재준씨가 홍난파의 친일행적을 이유로 제 46회 ‘난파음악상’을 거부해 화제가 됐다. 소프라노 임선혜씨를 다시 선정했으나 그녀 또한 상 받기를 거부했다.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아온 난파음악상이 음악가들로부터 연이어 ‘퇴짜’를 맞았다.
홍난파는 친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친일가요를 작곡하고, 신문에 기고를 하는 등, 친일 행동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2009년 친일 인사 명단에 올렸다. 홍난파는 졸지에 ‘국민 작곡가’에서 ‘친일 작곡가’로 전락했다.
무섭다. 역사가 이렇게 무섭다. 그렇다. 역사는 무서워야 한다. 그래서 역사를 무서워해야 한다. 한 세월 허랑방탕 살다가고 말 사람이 아니라면 역사를 무서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싸움질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역사가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같다.
그런데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거창한 게 아니다.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 하나하나가 쌓여 그대로 역사가 된다. 아버지의 족적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전해진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나는 역사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연말이 다가온다. 송년모임에서 또 ‘고향의 봄’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역사를 생각하게 될 성 싶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4 00:22
2026.01.04 00:22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