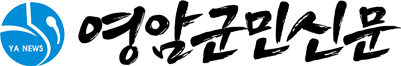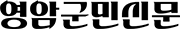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근거해 이듬해인 1950년 '교과용 도서검인정 규정' 및 '국정교과용 도서편찬 규정'이 공포된다. 이때부터 교과서 내용은 교육부(당시에는 문교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 시작했다. 또 교육법에 근거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령은 1983년 발효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른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국정교과서는 1종도서, 검정교과서는 2종도서로 규정하고, 인정도서제를 두고 있다. 1종도서는 초등학교 전 교과서와 지도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국사였다. 그 밖의 도서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종도서, 즉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편찬을 위탁할 수 있다. 2종도서인 검정교과서는 교육부의 검정을 받은 도서다. 검정은 교육부 위촉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하게 되는데, 1차는 교과서 사용학년도 개시 1년 전에 교육부가 공고한 기준에 의하며, 2차 심사는 1차 심사 때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인정교과서는 각 시·도 교육청의 승인, 신청에 따라 교육부가 인정하는 교과서다.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제도는 유신정권 때인 1977년 '검인정교과서파동'에서 보듯 정부로 하여금 교육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유신정권은 당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해 건전한 국민정신을 진작시킨다는 이른바 '서정쇄신'을 앞세워 한국검인정도서공급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로 인해 출판계는 세대교체가 이뤄질 정도로 초토화된다. 유신정권이 이처럼 검인정도서공급회사에 칼을 들이댄 것은 다름 아닌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실제로 검인정교과서파동의 결과 많은 검인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의 지난 10월12일자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로 촉발된 논란 역시 정부의 교과서 내용에 대한 영향력 강화 의도다. 검찰과 국세청이라는 사정의 양 칼을 들이댄 유신정권의 검인정교과서파동 때와는 달리 막가파식 억지 주장이 이념의 탈을 쓴 채 '국민 편 가르기'로 추동력을 얻고 있다.
여당 김무성 대표는 아예 '역사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사활을 걸었다. 새누리당 의원인 이정현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며 '현행 역사교과서는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교재'라고 규정해버렸다.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국정화 방침에 토를 달지 말라고 국회에서 엄포를 놨다.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5년엔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의 몫"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박 대통령이었다. 이런 그가 역사를 정부가 고쳐 쓰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나선 것은 '정치적 신원(伸寃)투쟁'일 뿐만 아니라 총선, 더 나아가 대선 승리만을 염두에 둔 권모술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라를 온통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블랙홀에 빠지게 해놓고 반대세력에게는 고질적인 색깔론을 앞세우면서 지지세를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빤하다. 결국 치졸하기 짝이 없는 역사전쟁을 끝내려면 시민사회가 무지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일 외에 별도리가 없을 것 같다. 이를 테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말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2.31 23:13
2025.12.31 23:13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