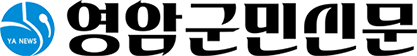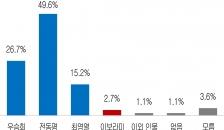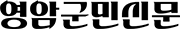|
| 이영현 소설가 양달사현창사업회 사무국장 |
이날 기념사에서 전 도경시(道警視, 경찰총경) 구자경 군수는 일조동조론(日朝同祖論)에 따른 내선(內鮮) 융화와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고, 임시정부에서 현상금까지 내걸었던 김서규 전라남도지사는 조선인의 사명과 의무에 대해 일장 훈시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현 영암중학교 앞에 소나무를 심은 영암의 해결사 효도카즈오(兵頭一雄)와 영암초등학교 뒤에서 전국 명품 소주 황천(皇泉)을 제조·판매하던 스가와라사다요시(菅原貞吉) 대표를 비롯한 영암 거주 일본인들, 김자삼 영암면장을 비롯한 11개면 면장과 유지들의 찬조금 행렬이 이어졌다. 타 시군의 예를 본다면 기념식 후에는 시가행진과 연회까지 곁들였을 영암의 대축제 날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날은 우리 영암의 반만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객사가 사라졌다. 왕의 전패(殿牌)를 모셨던 객사를 쓸어버리고 군청을 앉힘으로써, 이제 우리 영암 땅에서는 객사를 흔적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실추된 왕권 회복을 위해 군수들에게 전패의 봉안과 의례 봉행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늘 지시한 탓에 나름대로 왕의 권위를 엿볼 수 있었던, 영암에서 가장 위풍당당하게 지어진 객사는 을사늑약 후부터 방치되어 폐가로 전락했다가 그렇게 자취를 감췄다.
둘째, 동헌이 사라졌다. 조선 개국 85년(1476)년에 건립된 동헌 본관이 59평으로 너무 좁은 데다, 대지도 908평밖에 되지 않아 신축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작청(현 등기소)이며 형방청(현 한전) 등을 버리고 굳이 청사를 옮긴 것은 영암성 축성 이후 5백여 년 동안 서남해안을 호령했던 영암군의 정신적인 지휘소를 없애려는 일제의 음모가 깔려 있었다. 군사권과 사법권에 이어, 동헌마저 잃어버린 영암군수는 이제 일본식 신청사에서 일본 군속들의 눈치를 보면서 짐짓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일본 앞잡이 노릇을 자행했다.
마지막으로(아마도 이게 가장 큰 의미이겠지만) 영암군민 모두가 황국신민으로 전락했다. 실은 이날 영암군청 신축보다 더 의미 깊은 행사는 영암 신명신사(神明神社) 준공식이었다. 일본인들은 이미 1910년 이전부터 영암에 사는 일본인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영암성의 내성이자 동헌의 안산인 객사등에 신사를 설치하여 공공연히 참배해 오고 있었는데, 효도카즈오를 중심으로 한 영암유지 19명의 신청에 의해서 이세신궁(伊勢神宮)을 본산으로 하는 영암 신명신사가 다음날 정식으로 허가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5월 28일 발행된 총독부관보에 5월 23일자로 허가 고시되었다.
말하자면 일제는 자신들의 천신(天神) 아마테라스를 모신 신사 밑에 영암군청을 끌어다 앉힘으로써 영암군민이 황국신민이 되었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었다. 학생들은 참배 때마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국민입니다'라는 황국신민 서사를 월출산이 쩡쩡 울리도록 합창하면서 일본인임을 자랑스러워 했고, 철딱서니 없는 영암사람들은 벚나무와 화초들로 단장된 객사등을 일조(日朝) 합작의 영암 최초 도시공원이라면서 영암의 명소로 소개했다.
아무튼, 왕의 권좌를 밟고 선 이 부끄러운 영암군 신청사는 해방 이후에도 존속되었다. 1952년 8월 22일, 공비들의 난입으로 전소된 후에도 박종환 군수는 옛 동헌 자리가 이미 개인에게 매각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청사를 재건축했다. 1959년에는 신명신사 터에 6·25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충혼탑이 세워졌고, 1984년에는 신사 참배객들이 손을 씻던 그 자리에 조극환 선생 등을 추모하는 3·1 운동 기념탑을 건립했다.
1929년 5월 22일 밤은 유난히 길었다. 신사에서 날아온 벚꽃잎들이 어둠과 불빛 사이를 희끗희끗 흩날리는 가운데 어지러운 게다 소리와 기모노 자락스치는 소리가 밤새도록 골목을 누볐고, 이따금 일본인들과 지역유지들이 술에 취해 떠드는 소리에 군청 앞 경찰서(현 중원회관 뒤편) 순사들과 헌병대(현 한전) 군속들은 수시로 시내를 순찰해야만 했다.
영암군청이 끌려 내려온 이 치욕스러운 역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6.01.02 13:38
2026.01.02 13:38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