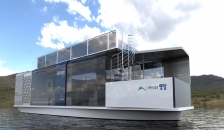‘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은 주로 길 옆에 묘를 썼다. 최초의 로마식 가도(街道)이자 제국 존속기간 동방으로 가는 대동맥이었던 ‘아피아가도’를 만든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그 시초라고 한다. 그는 아피아가도 옆에 무덤을 만들어달라고 유언했다. 길 옆 묘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말을 주로 새겼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때문이다.
16세기 이후 유명한 비문들이 시인들에 의해 지어지면서 ‘에피그램(epigram)’이라는 문학 장르를 형성하기도 한다. 묘비명에 두고두고 새길만한 명언명구(名言名句)가 많은 것은 이런 연유다.
몇 해 전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비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고 쓰여 있다. 필자는 이를 보고 ‘대중이 살아 깨어 있으면서 지도자들을 감시·비판하고 질타할 수 있을 때에만 혁명은 성공한다’고 갈파한 조지 오웰(George Orwell)을 떠올렸었다.
영암군농민회가 투병 끝에 저 세상으로 간 조광백 전 회장을 추모해 2일 묘비를 세운다고 한다. 농민이 행복한 세상을 염원하는 글귀가 새겨졌으면 싶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1.19 07:45
2025.11.19 07:45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