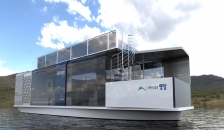|
활짝 핀 목련 반가워 잊혀진 감각 되살아난듯
■서양화가 김희규는
홍익대 미술학부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국선에 4차례 입선했고, 목우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고고학에 심취한 신문사 친구에 이끌려 월출산의 문화유적을 찾아 나섰다. 그길로 고향에 정착해 영암군산악회를 만들고 월출산을 샅샅이 뒤졌다. 등산로를 정비하고 문화재를 발굴해나가는 과정에서 용암사 터에서 ‘마애여래좌상’을 발굴해 국보(제144호)로 지정하는 감격을 맛보기도 했다.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탓에 오른손이 불편하다. 영암군번영회장, 월출산국립공원 영암군지부장, 5·18기념재단 영암지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7년 7월부터는 영암문화원장을 맡아 영암의 역사문화 진흥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왕인문화축제’와 악성 김창조 선생을 기리는 ‘현의 축제’ 등의 기반을 다졌고, 도포제 줄다리기를 비롯해 ‘장부질노래’, ‘갈곡들소리’ 등 향토민속의 발굴 및 재현에 성공해 남도문화제 최고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이런 공로는 정부도 인정해 대한민국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가 군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운 ‘희규미술관’이 자리한 월출산 천황사 입구가 최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돼 영암군이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당 한쪽에 다른 꽃들에 질세라 활짝 꽃망울을 터뜨린 이 목련은 반갑기도 하다. 다시 잡은 붓을 도무지 놓을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목련 너머로는 우람한 바위가 와락 달려들 기세다. 그래서인지 붓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이 실리는 듯하다. 평생을 그리려 했지만 지금도 못다 그린 월출산이다.
서양화가 김희규씨.
8-9년 전이나 됐을까, 누군가가 연세가 몇이냐고 묻길래 59세라고 대답한 기억이 있다. 지금 나이 역시 그 쯤 됐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이나 흘렀다.
칠순을 앞둔 이 노(老)화가가 다시 붓을 들었다. 자식들에게 칠순잔치 대신 작품전시회를 하겠다며 미술관 하나 빌려 달라고 다짐받아놓았기 때문이다.
“명색이 남들이 모두 명문이라고 부르는 미술대학을 나왔는데 이 나이에 화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칠순을 기념해 ‘이 정도의 작품을 그렸습니다.’하고 내놓을 수는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동안 지역 일을 하느라 못한 그린 그림을 남은 기간 열심히 그려 꼭 전시회를 열어볼 작정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칠순잔치를 위해 식당을 빌리는 대신 전시회를 위해 미술관 좀 빌려달라고 해놓았어요.”
그가 사재를 털어 군단위에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은 ‘희규미술관’ 2층 작업실은 마무리 붓질을 기다리는 작품들이 널려있다. 어림잡아 200여점, 아니 얼추 500여점 가까이 될 성 싶다. 자세히 보니 대부분의 작품에 서명이 없다. 미완성 작품들이다. 잔설이 남아 있는 월출산 그림은 눈이 왔다 녹는 시기에 그렸다가 봄이 오면 더 이상 그리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겼다. 그러다보니 잔손질이 몇 년이나 계속됐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면 볼수록 고칠 것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술하려면 ‘똥배짱’이라도 있어야 하나 봐요. 지금은 정상급의 화가가 된 친구들이나 동창들이 출품하라는 권유가 있지만 엄두가 안 납디다. 그래서 쌓아둔 미완성 그림이 산더미 같네요. 열심히 완성해서 나만의 전시회를 열랍니다.”
화가 세잔느가 평생을 두고 ‘생트빅트와르산’을 그렸듯이 월출산 역시 그가 평생 그려온 대상이다. 두텁게 쌓였던 눈을 훌훌 털어버리고 울긋불긋 치장을 시작한 바위산을 그리는 그의 붓끝은 절로 힘이 실린다.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각도 이젠 많이 되살아났다.
“아무리 떠나려 해도 떠나지 못하고 월출산에 살다보니 춘하추동의 변화를 담게 됐어요. 그렇다고 무슨 대작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화를 그린다는 생각이지요. 이 나이에 한국화단을 움직일 힘은 없는 것이고, 정말로 좋아서 그리는 그림이니 이제는 붓 끝에 절로 힘이 실리고 옛 감각도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노화가의 꿈은 또 하나 있다. 바로 군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세워진 희규미술관을 다시 여는 것이다.
“전시된 작품들을 꼭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야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지금의 사정이지요. 미술관을 개인이 운영하는데 있어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절감했어요, 투자가 없으니 미술관 전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이지요. 다행히 지난해 9월에 미술관 일대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지금 영암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운영방법을 찾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월출산 전망대도 만들고 등반객을 위한 매점도 꾸려보고 싶고 그럽니다.”
홍익대 서양화과 재학 중 국전에 무려 4회나 입상했고, 목우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이처럼 먼저 화가가 됐지만 ‘그림’보다도 ‘지역 일’을 더 많이 했다. 고고학에 미친(?) 친구와 함께 찾은 월출산 용암사 터에서 장엄한 마애여래좌상을 발견한 감격이 그 단초다. 내친 김에 아내를 설득해 고향에 내려와 ‘영암군산악회’를 만든 그는 이때부터 아예 ‘영암 문화’에 푹 빠져버렸다.
사재를 털어 희규미술관과 문화원을 세우고, 향토지 ‘월출의 맥박’을 발간해 지역문화 전파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문화원에 마련한 공연장 등은 영암의 소리를 찾는 이들, 놀이문화를 갈구하는 청소년 등에게 아예 열쇠를 맡겼다. 군민예술제, 월출학생종합예술제, 세시풍속경연대회, 마을훈장 위촉, 왕인박사와 도선국사 등 역사적 인물의 재조명, 향토사 정비 등도 그의 손을 거쳤다.
지역의 ‘일’을 위한 자리를 맡을 때마다 “임기가 끝나면 월출산 그림이나 실컷 그리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 그러나 다짐은 그 때 뿐이었다.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이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필이면 1980년 5·18 때 옥살이 후유증인 손떨림이 심해진 지금에 와서야 월출산을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떨림이 심한 오른손 대신 왼손에 든 붓끝이 힘차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다. 오늘따라 월출산이 생기도 가득하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25.11.19 07:45
2025.11.19 07:45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