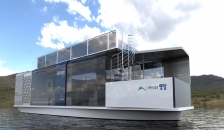|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삼정KPMG 부회장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10년 가까이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은 OECD기준을 적용할 때 국민의정부가 끝난 2003년에 60.4%에서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56.4%로 감소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55.5%로 떨어졌다. 국민 총소득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에 54%에서 2007년 49.4%, 2009년에는 48.1%로 줄어들고 있다. 안정된 국가, 선진국 일수록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두텁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중산층이 OECD기준으로 60%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산층은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상하, 좌우를 연결하는 중추로서 정치·사회적 갈등에서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완충장치, 안전판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험신호다.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OECD는 중위소득(총가구 중에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을 빈곤층, 50-150%까지를 중산층,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미국에서는 중산층(the middle class)을 “먹고 살만한 충분한 연소득이 있으며 퇴근길에 피자 한판을 사거나, 영화관람, 국제전화 등에 아무런 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위싱턴 타임즈, 2003.11)”이라고 이해한다. 반면에 프랑스(퐁피듀, 前 대통령)는 “외국어 하나쯤을 자유롭게 구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추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악기 한 가지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집에서 별미의 음식을 만들어 손님접대를 할 수 있으며,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설 줄 아는 국민”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좀 특별하다. 냉전시대의 좌우 이념대립과 전쟁 등 역사적 경험과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연유로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계급’이라는 용어를 금기시 하였다. 그 대신 1960년대부터 ‘중산층(中産層)’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이것은 계급적 의미의 ‘중간층’이라기보다는 상류층(부르주아)과 하류층(프롤레타리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와 같은 복합적 개념이다. 그렇다 보니 각자의 주관적 이해관계나 해석에 따라서 상류층과 하류층의 상당한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OECD의 분류보다는 더 광역적이며, 선진국 보다는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도시 서민과 자작 농어민을 아우르는 생계형에 가깝다. 그 중산층의 소득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국가경제가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서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기는커녕 갈수록 고통 받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우리나라 중산층은 요즘 고실업, 고물가, 전세대란, 자산가치 폭락 등 자력으로 회생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경제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 준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1분기의 국내총소득(GDI)이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소득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물건을 살 여력이 고갈된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은 이 정부 출범초기부터 유지해 온 고환율 정책 등 대기업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 농어민과 도시 서민 등 중산층이 정책에서 배제된 후유증이다.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성장전략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계층 이동을 도와줄 ‘사다리’를 만드는 정책적 균형을 간과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언론이 나서 ‘희망의 사다리 놓기’를 선도하면서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궤도 수정에 나섰지만 그 성과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여서 새 정부 출범초기에 맞추어 국정운영 기조가 정해지면 중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하나의 국가정책이 결정되어 논의를 거치고, 입법절차를 마친 후 정책집행의 결과가 효과로 나타나기 까지는 빨라야 2년에서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책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의 영속성이 끊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산층과 도시 서민의 미래가 더욱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이 처한 현주소는 죽어라 일해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워킹 푸어(working poor), 집은 있는데 대출금의 이자도 못내는 허울뿐인 주택보유자인 하우스 푸어(house poor),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고학력 실업의 아카데믹 푸어(academic poor)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추락은 현재화된 위험이지만 더 큰 위기는 미래에 대한 절망의 확산이다. 이것은 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몰아가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소설 ‘아틀라스(Atlas)’를 통해 생산 없는 분배, 발전 없는 평등주의 등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사회적 착취로 묘사하며 비판했던 작가이자 철학자 아인 랜드(Ayn Rand)도 “상류층을 한나라의 과거라면, 중산층은 그 나라의 미래”로 바라볼 만큼 중시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할 지적이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왕도와 다름없다. 허리가 꺾이면 불구가 되듯이 사회적 안전판이 무너지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산층이 위기다.
김명전 www.yanews.net
 2025.11.19 06:19
2025.11.19 06:19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