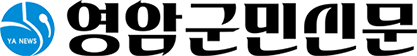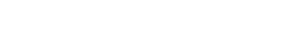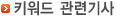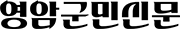정부가 내놓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을 명목으로 총 70만㏊에 이르는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8만㏊ 가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당초에는 이를 농가별로 의무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는 등 각종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의무감축이 아닌 '참여 유도형 감축'으로 전환하고, 패널티 부과 대상도 개별 농가 대신 지자체로 변경하는 등 자율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감축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타 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을 통해 면적감축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나 두루뭉술하기 짝이 없다. 일각에서는 필요한 예산도 불명확한데다, 올 벼농사 시점까지 8만㏊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벼 재배면적 감소율은 1%도 채 안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농가소득뿐 아니라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는 농민, 그리고 각 지자체 및 지역농협 등과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일본은 60년대 말 320만여㏊이던 벼 재배면적을 130만여㏊로 줄이는데 50년이 걸렸다. 주산지별 브랜드 차별화와 소비자 맞춤형 재배에도 적극 나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주먹구구식 접근은 쌀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6.01.02 07:12
2026.01.02 07:12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