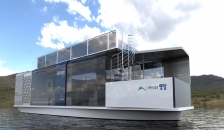20여년 전, 서예가 장전선생이 쓴 글이니 걸어놓고 보라며 친구가 선물로 준 글이다. 얼마전 신문에서 한국 서예계의 보물이 숨졌다는 그 분의 부음을 들었다. 아마도 친구는 이민살이가 팍팍하더라도 화 내지 말고 주위사람과 잘 어울리며 살아가라는 마음을 담아 주었으리라. 사무실에 들른 분들이 이따끔 명필로 휘갈겨 쓴 한자라 읽기가 어렵다면서 ‘저 글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마다 내용을 설명해주며 함께 뜻을 되새겨 보곤 한다.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나는 인덕(人德)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스스러움 없이 얘기하곤 한다. 살아오는 동안 좋은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었고, 그들이 내 삶의 고비고비에서 나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주 본란에 김영숙여사가 쓴 ‘복권당첨자의 아내 배려’란 칼럼 중 “인덕이 많다는 이들을 보면 대체로 묵묵히 참을 줄 알고, 남의 허물을 덮어 줄 줄 알고, 측은한 마음을 간직하여 작은 은혜도 잊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는 대목을 읽게 되었다. 내가 과연 ‘인덕이 많다’는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새삼스럽게 되돌아보았다.
곰곰 짚어보니 그 글에 표현된 삶의 근처에도 가지 못할 만큼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던 두 경우가 생각났다. 나를 비방한 글을 만들어 익명으로 여기저기 우송했던 A씨. 익명으로 위장했지만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런 글을 만들어 보냈는지 환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터무니 없는 이유로 험담을 하고 다니는 B씨, 이런 사람들을 향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여내기가 쉽지 않았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다 곰곰 생각해보니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유야 어찌됐건 내 쪽에서 그렇게 될 만한 작은 꼬투리라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까닦이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는 커녕 내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았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데 사람도 매 시간 변하지 않을까. 사람도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아침 사람과 저녁 사람이 다를 것이다. 오전에 잘못한 행동을 오후에 깨달았다면 그는 이미 오전의 그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내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들을 이해하기로 했다. 속에 담고 있으려니 내가 더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김여사의 글을 읽으면서 ‘인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해 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달아오른다. 유명한 서예가가 쓴 글이니 벽에 붙혀 놓고 매일 보아오기는 했지만, 글을 쓴 사람의 깊은 뜻을 통찰하지 못하고 몸가짐을 허투루 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담은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남는다는 말이 있듯이, 벽에 걸린 글을 오랜 세월 바라보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그 글이 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만도 한데, 나를 돌아보니 멀어도 한참 멀었다. 차라리 ‘덕불고’를 떼어내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명필을 내 걸고 자랑하면서도 그 뜻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글을 선물한 마음을 읽지 못한 것 같아 친구에게도 미안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1.19 09:13
2025.11.19 09:13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