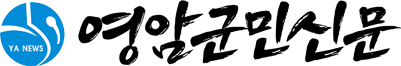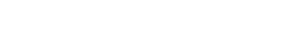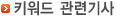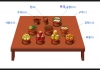|
제복은 문무백관이 종묘나 문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의복으로, 관(冠)부터 신발까지 예법에 맞춘다. 제복의 상징인 양관(梁冠)은 머리 위로 솟은 종선(縱線)의 수로 품계를 구분한다. 일품관은 7량, 2품관은 6량, 3품관은 5량으로 내려가며, 8품 이하 관원은 한 줄의 양을 단다.
수(繡)는 제복의 등 뒤를 장식하는 직물로, 품계별로 색과 무늬가 다르다. 2품 이상은 구름과 봉황을, 3~4품은 구름과 학을, 5품은 독수리, 6~7품은 때까치, 8품 이하는 원앙새를 수놓는다. 이는 각자의 덕과 지위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제관이 손에 드는 홀(笏)은 본래 기록용 도구였으나, 후대에는 예를 상징하는 의례물로 자리 잡았다. 상아나 회화나무로 만들어 5품 이상은 상아, 6품 이하는 목재로 사용한다.
이 밖에도 회색 비단으로 만든 중단(中單), 붉은색 치마 형태의 상(裳), 옥이나 금속으로 만든 각대(角帶), 그리고 패옥(佩玉), 방심곡령(方心曲領) 등이 제복을 구성한다. 무릎을 가리는 폐슬(蔽膝)과 붉은 띠 대대(大帶)도 예복의 필수 요소다.
착용 절차 또한 정교하다. 버선을 신고 행전을 맨 뒤 흑피리(黑皮履)를 신으며, 중단과 흑삼(黑衫)을 입고 대대를 두른다. 이후 각대와 패옥을 걸고 양관을 쓴 뒤 홀을 든다. 예복 하나에도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를 담은 유교의 정신이 스며 있다.
향교의 제관 복식도 품계에 따라 구분된다. 초헌관은 5량관, 아헌관은 4량관, 종헌관과 분헌관은 3량관을 쓴다. 집례와 축관은 2량관, 봉향·봉로 등은 유건(儒巾)에 도포(道袍)를 착용한다. 여성 제관은 당의(唐衣)를 입고 머리에 첩지(疊紙)를 하여 의관을 단정히 갖춘다.
전통 예복의 정제된 아름다움은 단순한 복식이 아니라, 유교적 질서와 예의의 상징이다. 석전제 제복은 지금도 향교의 제단 위에서 공자의 도를 잇는 예의 복식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16 20:17
2025.12.16 20:17 공식블로그
공식블로그